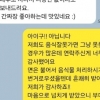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사내 하청 근로자 8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또 합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세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삼성이 힘을 보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80년간 지켜 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이 사실상 깨졌다는 점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노사 상생의 길을 삼성이 택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가전제품의 수리와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로 삼성전자의 지분이 99.33 %에 달하는 자회사다. 이 회사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3년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사 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서비스 기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사측 손을 들어 주고, 고용노동부 역시 “위장도급이나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사측이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전향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미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가 지난해 서비스센터 직원 5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현대차도 하청 직원 3500여명을 단계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고, 현대차도 불법 파견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식을 뛰어넘어 직접 고용하고, 채용 인원 역시 두 기업을 합친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삼성의 이번 조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 검찰의 ‘노조 와해 의혹’수사와 연관짓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지난 2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다 노조 와해 문건을 압수해 재수사에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경이 어찌 됐든 삼성이 세계 일류 기업에 걸맞지 않는 경영 기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는 가다. 눈앞의 송사를 염두에 둔 보여 주기식 조치가 아닌 진짜 노사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 노조와 함께 발맞춰 기업의 불투명성을 제거한다면 오히려 삼성의 경쟁력은 더 강화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가전제품의 수리와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로 삼성전자의 지분이 99.33 %에 달하는 자회사다. 이 회사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3년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사 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서비스 기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사측 손을 들어 주고, 고용노동부 역시 “위장도급이나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사측이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전향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미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가 지난해 서비스센터 직원 5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현대차도 하청 직원 3500여명을 단계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고, 현대차도 불법 파견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식을 뛰어넘어 직접 고용하고, 채용 인원 역시 두 기업을 합친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삼성의 이번 조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 검찰의 ‘노조 와해 의혹’수사와 연관짓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지난 2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다 노조 와해 문건을 압수해 재수사에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경이 어찌 됐든 삼성이 세계 일류 기업에 걸맞지 않는 경영 기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는 가다. 눈앞의 송사를 염두에 둔 보여 주기식 조치가 아닌 진짜 노사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 노조와 함께 발맞춰 기업의 불투명성을 제거한다면 오히려 삼성의 경쟁력은 더 강화될 수 있다.
2018-04-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