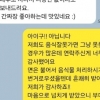사드 전자파·소음 기준치 못미쳐… 정부, 주민 설득과 지원책 서둘러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의 핵심 이유로 꼽혀 온 유해 전자파 논란이 현장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인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이 핵 위협 등 도발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 낼 방어체계 하나 제때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국방부와 환경부는 그제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다. 전자파는 발사대로부터 100m 떨어진 지점을 시작으로 4곳을 측정했으나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수치가 확인됐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에 불과해 현행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10W/㎡를 크게 밑돌았다. 소음은 측정 지점에서 모두 50㏈(데시빌) 내외로 전용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과 비슷했다. 박근혜 정부 때의 국방부 발표와 마찬가지로 전자파와 소음은 인근 주민들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게 한번 더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반대 측 주민들의 입장은 완고했다. 주민 추천의 전문가가 측정에 참관하지 않았고 단순 수치만 발표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드기지 앞을 지키며 시위, 집회도 계속 벌이고 있다. 국민의 70% 이상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도 외면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의 안보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급박해지고 있다. 절차적 문제를 거론했던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드 4기의 추가 임시배치를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예방전쟁 언급에 북한이 괌도 포위공격 등 구체적인 도발 계획까지 밝혀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한반도가 언제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마냥 미적거리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자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안보에는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 핵 공격은 예방밖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드는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더이상 설득력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렵다. 전자파 등 별다른 피해도 없는데 반대만 고집하는 것은 님비적 발상에 불과하다. 내 뒷마당을 지키려고 국민과 국가를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절차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보불안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난 4월 행정자치부와 국방부가 내놓은 주민지원책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한반도 문제에 운전자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사드 배치조차 제때 못한다면 누가 이를 믿겠는가.
2017-08-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