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을 놓고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다. 논란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을 10% 포인트 더 올리면 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느냐’는 문제다. 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보다 두 배가량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단 1% 포인트만 인상하면 되니 큰 부담이 없다는 주장으로 엇갈린다.
재삼 강조하는 것은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면서 국민연금을 연계시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명시한 것은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이다. 두 연금은 다 같이 개혁 대상인 공적 연금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다르다. 적자를 낸 지 오래된 공무원연금은 매년 예산에서 수조원을 보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개혁 취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바꿔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데 있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은 고갈에 대비해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40%로까지 낮춰 놓은 상태다.
두 연금이 놓인 상황이 다른 만큼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한다. 국민연금은 일찍 고갈될 경우 세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연금정책으로 미래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 소득대체율 40%로는 ‘용돈’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생계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말하자면 고갈 시기 연기와 노후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따라야 한다. 그런 것을 개혁 같지도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문제를 타협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졸속 처리한 것은 잘못돼도 매우 잘못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는 논외로 하고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백가쟁명식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견해가 중구난방으로 나오듯이 국민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보다 더 복잡하고 따져 봐야 할 점이 많다. 정치인 몇 사람이 가입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늘지에 대한 얕은 지식만 갖고 시혜를 베풀 듯 정쟁을 벌일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공무원연금에서도 보았듯이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없다. 누군가 져야 할 부담은 덮어 놓고 무조건 더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갈 어리석은 국민이 아니다.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율을 높이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세대 갈등을 촉발할 것도 너무나 뻔하다. 대체율을 40%로 유지할 것인지, 5% 포인트든 10% 포인트든, 아니면 20% 포인트든 얼마나 올릴 것인지를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 즉 공론화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더 세밀한 재정 추계도 해 봐야 하고 가입자들이 부담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도 살펴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수십 년 이후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추정 가능한 미래상을 그려 놓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지금부터 찬찬히 논의해 나가야 한다.
재삼 강조하는 것은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면서 국민연금을 연계시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명시한 것은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이다. 두 연금은 다 같이 개혁 대상인 공적 연금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다르다. 적자를 낸 지 오래된 공무원연금은 매년 예산에서 수조원을 보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개혁 취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바꿔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데 있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은 고갈에 대비해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40%로까지 낮춰 놓은 상태다.
두 연금이 놓인 상황이 다른 만큼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한다. 국민연금은 일찍 고갈될 경우 세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연금정책으로 미래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 소득대체율 40%로는 ‘용돈’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생계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말하자면 고갈 시기 연기와 노후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따라야 한다. 그런 것을 개혁 같지도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문제를 타협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졸속 처리한 것은 잘못돼도 매우 잘못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는 논외로 하고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백가쟁명식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견해가 중구난방으로 나오듯이 국민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보다 더 복잡하고 따져 봐야 할 점이 많다. 정치인 몇 사람이 가입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늘지에 대한 얕은 지식만 갖고 시혜를 베풀 듯 정쟁을 벌일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공무원연금에서도 보았듯이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없다. 누군가 져야 할 부담은 덮어 놓고 무조건 더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갈 어리석은 국민이 아니다.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율을 높이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세대 갈등을 촉발할 것도 너무나 뻔하다. 대체율을 40%로 유지할 것인지, 5% 포인트든 10% 포인트든, 아니면 20% 포인트든 얼마나 올릴 것인지를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 즉 공론화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더 세밀한 재정 추계도 해 봐야 하고 가입자들이 부담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도 살펴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수십 년 이후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추정 가능한 미래상을 그려 놓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지금부터 찬찬히 논의해 나가야 한다.
2015-05-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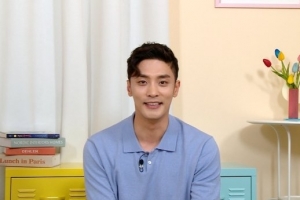

![마지막 검색어는 ‘성추행’…수의대생 윤희씨는 어디에 [사건파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3/SSC_20250123205338_N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