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국면에 특검 도입론이 분출 중이다. 얼마 전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이어 그제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가세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 없다”고 화답했다. 다만 여야가 ‘선 검찰수사, 후 특검’이란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게 특검 도입의 관건이다. 특검에 대한 여야 일각의 신중함이 국정의 블랙홀을 야기할 중차대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당·정·청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면 여야가 상설특검제 가동 협의를 서두를 때다.
대검 특별수사팀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 가진 전화 인터뷰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그제 그의 측근 1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 금지했다. 그가 돈을 줬다고 거명한 이완구 국무총리 등 실세 8인을 소환 조사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 사실 검찰이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객관적 증거 위주로 공정하게만 수사한다면 굳이 특검을 가동할 필요는 없다. 상설특검제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와 정부의 추인·이행 결정 등 논란과 시비가 따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문무일 팀장이 다짐한 그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가 ‘만악의 근원’으로 투영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미 현직 총리와 전·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구명 요청의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도 참담하다.
더욱이 성 전 회장이 이번 자원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구명 로비를 편 사실을 넘어 역대 정권에서 여야 정치권과 ‘거래’를 한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검찰이 과거 이탈리아 전체 국회의원의 4분의1이 수사를 받던, 마니테 폴리테(깨끗한 손) 운동 때 이상으로 청와대든 정치권이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야 할 이유다. 정·경·관 유착의 고리를 끊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다. 그럼에도 기획·편파 수사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면 큰 문제다. 검찰 수사 상황이 수시로 법무부와 청와대로 보고되는 구조인데 리스트에 이름을 걸친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할 개연성 때문이다. 이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진다.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못할 까닭도 없다. 이번 사건처럼 여권 실세가 관련돼 검찰의 독립적 수사가 제약될 개연성을 우려해 지난해 2월 상설특검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 않은가.
그런데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주도적 역할을 하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등 미리 선을 긋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 새정치연합의 이런 만만디 자세가 광주서을 보선에 출마한 천정배 후보가 비판한 것처럼 특검에서 밝혀질 진실이 두렵기 때문이라면 딱한 노릇이다. 그렇지 않고 검찰 수사 후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략에서 나온 발상이더라도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진실 규명보다 당리를 앞세워선 안 될 말이다.
대검 특별수사팀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 가진 전화 인터뷰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그제 그의 측근 1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 금지했다. 그가 돈을 줬다고 거명한 이완구 국무총리 등 실세 8인을 소환 조사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 사실 검찰이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객관적 증거 위주로 공정하게만 수사한다면 굳이 특검을 가동할 필요는 없다. 상설특검제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와 정부의 추인·이행 결정 등 논란과 시비가 따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문무일 팀장이 다짐한 그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가 ‘만악의 근원’으로 투영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미 현직 총리와 전·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구명 요청의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도 참담하다.
더욱이 성 전 회장이 이번 자원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구명 로비를 편 사실을 넘어 역대 정권에서 여야 정치권과 ‘거래’를 한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검찰이 과거 이탈리아 전체 국회의원의 4분의1이 수사를 받던, 마니테 폴리테(깨끗한 손) 운동 때 이상으로 청와대든 정치권이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야 할 이유다. 정·경·관 유착의 고리를 끊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다. 그럼에도 기획·편파 수사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면 큰 문제다. 검찰 수사 상황이 수시로 법무부와 청와대로 보고되는 구조인데 리스트에 이름을 걸친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할 개연성 때문이다. 이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진다.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못할 까닭도 없다. 이번 사건처럼 여권 실세가 관련돼 검찰의 독립적 수사가 제약될 개연성을 우려해 지난해 2월 상설특검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 않은가.
그런데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주도적 역할을 하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등 미리 선을 긋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 새정치연합의 이런 만만디 자세가 광주서을 보선에 출마한 천정배 후보가 비판한 것처럼 특검에서 밝혀질 진실이 두렵기 때문이라면 딱한 노릇이다. 그렇지 않고 검찰 수사 후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략에서 나온 발상이더라도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진실 규명보다 당리를 앞세워선 안 될 말이다.
2015-04-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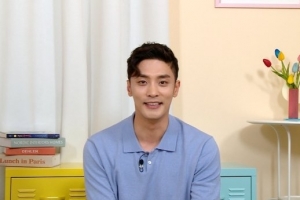

![마지막 검색어는 ‘성추행’…수의대생 윤희씨는 어디에 [사건파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3/SSC_20250123205338_N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