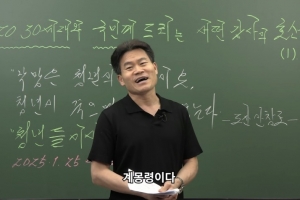자원외교의 난맥상을 파헤치려던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해외자원 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다. 특히 그는 자살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허태열·김기춘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과거 거액을 전달했다고 폭로해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왔다. 그의 자살로 자원 비리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터에 검찰은 그에게 돈 받은 인사들을 가려내야 할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검찰은 성역 없는 엄정한 잣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불식시키기를 당부한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6년 김 전 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2007년 허 전 실장에게 7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폭로 내용의 진위에 대해 현재로선 어떤 예단도 섣부른 일이다. 당사자들이 “황당무계한 악의적인 얘기”라고 펄쩍 뛰고 있다고 해서만이 아니다. 죽은 사람은 더는 말이 없는 데다 돈을 줬다는 물증도 아직은 없는 탓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은 당사자들의 해명만 믿고 미적대다 사건을 미궁으로 빠뜨려선 안 될 말이다. 당장 성 전 회장의 진술이 꽤 구체적이다. 김 전 실장에게는 “VIP 모시고 독일 갈 때”, 허 전 실장에게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서너 차례 나눠서”라며 돈의 전달 시점을 적시했다.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방증 수사를 통해 최소한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 볼 근거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적은 메모가 나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성완종 리스트’ 실체 규명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할 판이다. 물론 김·허 두 전 실장과 이완구 총리, 이병기 비서실장 등 현 정부 실세 8명의 이름이 포함된 메모도 아직 일방적 의혹 제기일 뿐이다. 또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 실세들이 거명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메모의 진실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성 전 회장은 사망 전 회견에서 자신은 친이가 아니라 외려 이명박 정부의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그가 억울해하는 이유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친이’가 아닌 ‘친박’인데도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다. 더욱이 그가 친이·친박을 넘어 여야를 넘나든 충청권의 ‘마당발 최고경영자(CEO) 정치인’이었다는 점에서 ‘성완종 리스트’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인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검찰이 정치적 입김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 위주로 당당하게 수사해야 할 이유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이번 비극적 선택을 뼈아프게 여겨야 한다. 혹여 강압 수사가 없었는지 되돌아보란 뜻이다. 이 총리가 ‘부정부패 척결’ 발언으로 호루라기를 불자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자원개발에 나섰던 경남기업, 포스코, SK 등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는 인상을 줬다면 정부 또한 표적 수사 시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이제부터라도 자원 비리든, ‘성완종 리스트’든 오로지 진실 규명에만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 속에 현 정부가 국정 동력을 확보할 첩경이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6년 김 전 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2007년 허 전 실장에게 7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폭로 내용의 진위에 대해 현재로선 어떤 예단도 섣부른 일이다. 당사자들이 “황당무계한 악의적인 얘기”라고 펄쩍 뛰고 있다고 해서만이 아니다. 죽은 사람은 더는 말이 없는 데다 돈을 줬다는 물증도 아직은 없는 탓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은 당사자들의 해명만 믿고 미적대다 사건을 미궁으로 빠뜨려선 안 될 말이다. 당장 성 전 회장의 진술이 꽤 구체적이다. 김 전 실장에게는 “VIP 모시고 독일 갈 때”, 허 전 실장에게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서너 차례 나눠서”라며 돈의 전달 시점을 적시했다.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방증 수사를 통해 최소한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 볼 근거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적은 메모가 나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성완종 리스트’ 실체 규명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할 판이다. 물론 김·허 두 전 실장과 이완구 총리, 이병기 비서실장 등 현 정부 실세 8명의 이름이 포함된 메모도 아직 일방적 의혹 제기일 뿐이다. 또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 실세들이 거명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메모의 진실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성 전 회장은 사망 전 회견에서 자신은 친이가 아니라 외려 이명박 정부의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그가 억울해하는 이유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친이’가 아닌 ‘친박’인데도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다. 더욱이 그가 친이·친박을 넘어 여야를 넘나든 충청권의 ‘마당발 최고경영자(CEO) 정치인’이었다는 점에서 ‘성완종 리스트’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인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검찰이 정치적 입김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 위주로 당당하게 수사해야 할 이유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이번 비극적 선택을 뼈아프게 여겨야 한다. 혹여 강압 수사가 없었는지 되돌아보란 뜻이다. 이 총리가 ‘부정부패 척결’ 발언으로 호루라기를 불자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자원개발에 나섰던 경남기업, 포스코, SK 등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는 인상을 줬다면 정부 또한 표적 수사 시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이제부터라도 자원 비리든, ‘성완종 리스트’든 오로지 진실 규명에만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 속에 현 정부가 국정 동력을 확보할 첩경이다.
2015-04-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