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使政) 대타협이 결렬됐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어제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협상에 앞서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 ‘수용불가 5대 사항’을 정부와 경영계에 요구한 바 있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을 올 3월 말까지 도출한다고 합의한 이후 100일 가까이 협상을 이어 갔지만 결국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특히 5대 사항 중 저(低)성과 근로자의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세계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이다. 1970~80년대 산업화시대의 고도성장 시기에 구축된 연공서열과 평생고용의 노동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잃어버려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건 정부의 전략부재, 노동계의 기득권 수호, 사용자측의 비타협적 자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해고요건 완화 등 고용유연성 이외에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 확대, 임금피크제 등도 노동시장의 전면적 새판 짜기와 맞물려 있다.
이런 중대한 역사적 임무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고용유연성 등 핵심인 5개 불가 사항을 내놓으며 사실상 노동개혁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과 전체 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안팎이다. 근로자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대기업 노조원들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구조조정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100원이라고 할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7원에 불과하다.
일단 대기업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한국 노동시장 특유의 이중구조가 만들어지는 근원부터 개선해야 한다. 이들 ‘철밥통 노조’의 기득권과 과보호 탓에 기업들이 국내 신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대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막으면 안 될 것이다.
노사정 모두 실리보다는 명분에 집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 노사정 대타협은 일단 결렬됐지만 희망의 불씨는 미약하지만 살아 있다. 한국노총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완전히 철회한다면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겨 두기는 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토론을 통한 합의 문화’가 결핍된 우리 현실에서 노사정위원회 방식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지만 노동개혁 자체가 어느 일방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성사되는 일은 아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시대적 당위성을 갖고 있는 만큼 노사정 모두 대승적 양보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을 관철시켜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세계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이다. 1970~80년대 산업화시대의 고도성장 시기에 구축된 연공서열과 평생고용의 노동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잃어버려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건 정부의 전략부재, 노동계의 기득권 수호, 사용자측의 비타협적 자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해고요건 완화 등 고용유연성 이외에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 확대, 임금피크제 등도 노동시장의 전면적 새판 짜기와 맞물려 있다.
이런 중대한 역사적 임무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고용유연성 등 핵심인 5개 불가 사항을 내놓으며 사실상 노동개혁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과 전체 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안팎이다. 근로자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대기업 노조원들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구조조정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100원이라고 할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7원에 불과하다.
일단 대기업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한국 노동시장 특유의 이중구조가 만들어지는 근원부터 개선해야 한다. 이들 ‘철밥통 노조’의 기득권과 과보호 탓에 기업들이 국내 신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대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막으면 안 될 것이다.
노사정 모두 실리보다는 명분에 집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 노사정 대타협은 일단 결렬됐지만 희망의 불씨는 미약하지만 살아 있다. 한국노총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완전히 철회한다면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겨 두기는 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토론을 통한 합의 문화’가 결핍된 우리 현실에서 노사정위원회 방식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지만 노동개혁 자체가 어느 일방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성사되는 일은 아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시대적 당위성을 갖고 있는 만큼 노사정 모두 대승적 양보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을 관철시켜야 한다.
2015-04-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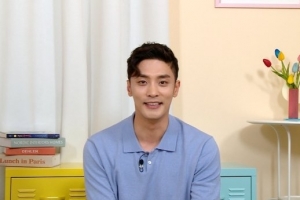

![마지막 검색어는 ‘성추행’…수의대생 윤희씨는 어디에 [사건파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3/SSC_20250123205338_N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