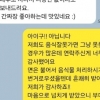‘베트남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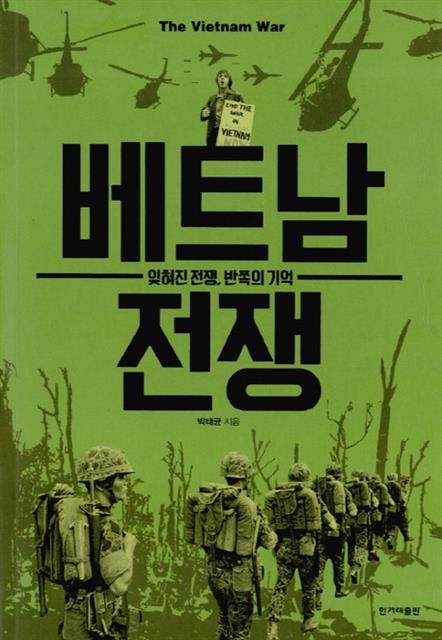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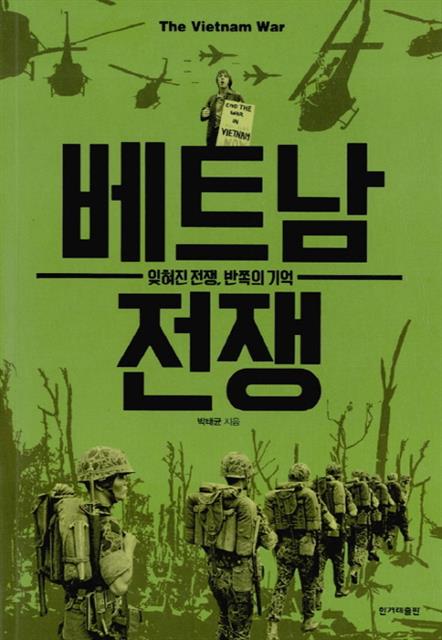
관련 책들도 많이 출간되었다. 여행서들은 옥석을 가리기 어렵고, 쌀국수로 대표되는 요리 관련 책들도 부지기수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몇 권의 책도 눈에 띄는데, 그중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베트남 전쟁’이 읽음 직하다. 박 교수가 베트남 전쟁에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현대사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1964년 첫 파병 이후 1973년 철수할 때까지 무려 32만명이 넘는 한국군이 그곳에 갔다. 이 가운데 무려 5000여명이 전사했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지금도 1만명 이상이 고통 받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의 최대 파병 국가였다. 당시 가장 가까운 우방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도 참전하지 않은 전쟁이었다.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한국의 군부와 대표였던 박정희가 “정권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한국군 파병을 먼저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베트남 내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적이 북베트남인지, 베트콩인지, 혹은 베트콩을 지지하는 남베트남 사람들인지 규정하지 못하고 시작한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무고한 사람들만 죽어갔다.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민간인 학살은 어쩌면 베트남 전쟁 시작과 함께 예정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박 교수는 우선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한다. 공산주의의 도발을 막는다는 사명감과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참전한 청년들은, 전후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명분 없는 전쟁의 뒷감당은 참전 용사들의 몫이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가해자였을지 몰라도, 그들 역시 고엽제 후유증과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는 그들에게 싸워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 개개인의 안보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안보를 위협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그들 자신과 싸워야 했다.”


장동석 출판평론가·뉴필로소퍼 편집장
장동석 출판평론가·뉴필로소퍼 편집장
2019-02-08 3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