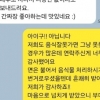‘방언의 발견’ 펴낸 정승철 서울대 교수
“표준어는 국가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 정한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 ‘권장어’일 뿐인데, 표준어를 쓰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정승철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표준어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표준어는 언제, 그리고 왜 나타났을까. 15일 연구실에서 만난 정승철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표준어라는 개념이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방언은 이에 따라 ‘없어져야 할 말’로 전락했다. 그가 최근 출간한 ‘방언의 발견’은 방언이 언제부터, 어떻게 표준어에 밀려 ‘2등 언어’로 전락했는지 보여 준다.
정 교수는 방언이 탄압받은 사례를 2016년부터 조사했다. 사례들을 모아 보니 표준어가 정해진 때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서울말과 지방어(방언) 간 대립 구도가 심각하지 않았다. 해방 이후부터 정부주도 국가정책을 펼치면서 방해가 된 방언의 지위가 급격히 낮아졌다. 방언은 분열과 비능률의 상징이 됐으며, ‘잡스러운 언어’ 취급을 받아 순화 대상으로 전락했다. 전국적으로 ‘서울말 쓰기 운동’이 펼쳐진 것도 이때부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너무 컸다. 정 교수는 “인권탄압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다.
“서울에 유학하던 학생이 사투리를 쓴다고 교사로부터 야단을 맞거나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입학이나 면접을 앞두고 사투리 교정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한 전자회사는 ‘사투리 잡는 TV를 개발했다’고 광고도 했죠. 사투리가 나오면 자동으로 이를 포착해 표준어로 고쳐 자막으로 보여 준다는 상품이었습니다. 사투리를 ‘고쳐 주는’ 게 아니라 ‘잡는다’는 표현은 방언의 낮은 위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제주 출신인 그는 이런 식의 방언 탄압이 황당할 따름이다. 그는 중학교 시절 서울에서 공부하다 방학이면 고향에 가곤 했다. 서울에서 공부하던 터라 자신이 서울말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부채를 부끈다’(부채를 부친다), ‘조골조골(간질간질) 간지럼 태운다’는 말들이 제주 방언이었음을 알고 놀랐다고 했다. 그는 1988년부터 방언을 연구했다. 30년째 연구해 보니, 사람이 그 지역 말을 쓸 때 표준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성과 정서가 살아나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일본이나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런 이유로 현재 표준어 사용을 강요하지 않는다. 방언을 존중하고, 표준어는 그저 ‘권장어’로 자리잡았다. 우리는 이에 반해 여전히 표준어 사용을 강요하는 느낌이 강하다. 그가 책 제목을 ‘방언의 발견’으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발견’은 방언의 가치를 발견하고, 방언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몰랐던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발견하자는 뜻이다.
●“방언의 잃어버린 가치 찾아야”
“근대화를 위해 국민을 통합하려는 표준어의 목표는 이미 달성됐습니다. 표준어는 이제 권장어로 남고, 방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4-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