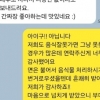日 전문가가 본 ‘서울 독립서점’
일본 누마북스 대표 우치누마 신타로와 아사히 출판사 편집자 아야메 요시노부는 2016년 6월 서울에 있는 소형서점 몇 곳을 둘러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험적인 서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소통을 활발히 하는 서점 등에 마음을 빼앗겼다. 내친김에 서울의 ‘핫’한 소형서점 14곳과 출판사·북카페 16곳의 대표 등을 만나 인터뷰하고 최근 ‘책의 미래를 찾는 여행, 서울’(컴인)을 냈다. 2일 두 전문가를 만나 서울의 소형서점에 끌린 이유를 물었다.

일본 누마북스 대표 우치누마 신타로(오른쪽)와 아사히 출판사 편집자 아야메 요시노부가 서울의 인기 있는 소형서점과 출판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한 ‘책의 미래를 찾는 여행, 서울’을 소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아야메 일본도 출판업계가 어렵다. 소형서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위기를 극복할 아이디어를 찾고 싶었다. 이왕이면 가까운 곳, 우리와 비슷한 곳에서 찾아봤다.
-우치누마 한국은 큰 서점도 무너지고, 출판계도 많이 어렵다고 들었다. 이런 와중에 소형서점 일부가 인기라더라. 왜 그런지 찾아보면 일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서울 소형서점이 일본과 다른 점은.
-아야메 서점을 준비하고 열기까지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최근 어떤 곳은 한 달 정도만 준비했다 하더라.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개월 정도 준비하고 시작해도 ‘그렇게 빨리 준비해 뭐가 되겠느냐?’고 할 정도다.
-우치누마 한국은 시작하고 나서 공부하고, 일본은 공부하고 나서 시작하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일단 시작부터 하니 실험적인 시도도 많이 하는 거 같다.
→소형서점은 큐레이션이 중요한데.
-우치누마 세세한 진열이나 큐레이션(책을 선정하고 진열하는 일)을 잘하는 곳도 많다. 서울 마포구 ‘땡스북스’의 진열대 책은 한글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재밌을 거 같은 책이 놓여 있다. 서울 서대문구 ‘유어마인드’는 독립출판물을 진열했는데, 대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을 잘 골라놨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야메 서울 마포구 북바이북은 자매 둘이서 맥주를 파는 서점이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며, 함께 소통하며 즐거워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예컨대 대표가 ‘혼술’(혼자서 술 마시는 일) 서가를 마련하면 고객들이 종이에다 멘트를 다는 ‘책꼬리’가 인상 깊었다.
→홍보나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우치누마 우리가 봤던 소형서점들은 ‘홍보나 마케팅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다. 일본과 다른 한국의 특징인데, SNS의 영향력이라고 본다. 소형서점에서 올린 게시물에 수백개의 ‘좋아요’가 달리는 일은 일본에서 극히 드물다. 한국은 재밌는 것을 즐기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젊은층만 즐기는 문화는 아쉽다.
-우치누마 동감한다. 소형서점이 젊은이들 중심으로만 유행하는 느낌이다. 부작용도 있다. 어떤 뮤지션이 카페를 하며 책을 파는 곳이었는데, 책을 ‘인테리어용’으로만 쓰더라. 적어도 서점이라면 방문하는 이들에게 책 소개는 해야 하지 않을까. 책을 그저 ‘인스타그램’(SNS의 일종) 배경으로만 써서는 안 된다.
→소형서점이 지속하려면.
-우치누마 역시나 책에 관한 애정, 그리고 서점을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앞으로 한국도 일본도 대형서점 체인점을 통해 서점을 확대하기에는 한계에 부닥칠 거다.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책을 팔고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느냐 고민하는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다.
-아야메 동감한다. 유명한 레스토랑에는 ‘바로 그 셰프’가 있으니까 가는 거다. 소형서점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출판업계에도 ‘이 출판사가 낸 책이어서, 이 편집자가 만든 책이어서 고른다’는 문화가 강해질 거다. 일본말 중에 ‘서점은 사람이다’라는 게 있다. 그야말로 딱 맞는 말이라 생각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4-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