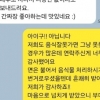송호근 교수, ‘천재 소설가’ 김사량 삶 담은 장편소설 펴내
“제가 1956년생인데 그 시대는 민족 또는 국가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새롭게 구축되는 시기였습니다. 폐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구구절절한 상황이었죠. 정신적인 구원의 버팀목이 없었던 ‘아버지 없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지난 70여년간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구축할 자원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저의 학문적·예술적인 질문을 두 번째 소설에 담았습니다.”
연합뉴스

두 번째 장편소설 ‘다시, 빛 속으로- 김사량을 찾아서’를 펴낸 사회학자 송호근 서울대 교수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설을 집필하게 된 계기에 대해 “논리는 매번 이념의 장벽에 부딪혀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에 상상력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유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김사량(본명 김시창·1914~1950)은 일본 도쿄제국대학 재학 중인 25세에 집필한 소설 ‘빛 속으로’로 일본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문학적인 자질을 갖춘 작가였다. 조선의 하층민들이 살아가는 풍속과 생존에 대한 끈기에 주목한 작품을 많이 선보였다. 1945년 일본 황군 위문단으로 북경에 파견된 그는 일제의 억압을 벗어나고자 연안의 태항산으로 탈출했고 그곳에서 조선의용군 선전대에 가담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남하해 북한 인민군 종군작가로 활동하면서 쓴 작품의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그의 작품은 한국문학사에 편입되지 못했다.
“김사량이 민족의 비애를 그린 1939년작 ‘빛 속으로’와 북한 체제 내에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1950년 종군기 사이의 거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듯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김사량이 예상치 못하게 변한 데 무슨 까닭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자율적인 변화일까. 예술을 총으로 만들어버린 사회주의 체제의 결과일까. 만약에 후자라면 예술가로서 김사량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에게 구원의 길은 있었을까 등의 복잡한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소설 속에서 신문기자로 등장하는 김사량 아들의 시선으로 김사량의 정신세계를 탐사해보았습니다.”
송 교수는 최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화해 무드가 조성된 남북을 보면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문학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고대와 미래를 마구 왔다 갔다 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 상상력의 미학이야말로 남북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을 쓰면서 했던 생각 중 하나는 ‘핵무기는 핵무기로 풀리지 않는다. 트럼프는 견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 무엇으로 (핵문제를) 풀 것인가’였습니다. 사회과학자로서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눈물이 핑 도는 교감으로부터 그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8-02-1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