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강정 ‘그저 울 수 있을 때…’ 산문집
‘세상의 눈치와 분별’ 속에서 우리는 늘 ‘못 우는 울음’을 속에 품고 산다. 하지만 시인에게 몸 안에 오랫동안 내장된 소리, 울음은 부질없는 엄살이 아니다. 시, 그리고 노래, 삶과 맞닿아 있는 울림이자 파동이다. 때문에 시인은 ‘나 자신의 물리적 현존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자주 울고 싶다’고 말한다. 노래하는 시인 강정(46)이 펴낸 울음에 관한 산문집 ‘그저 울 수 있을 때 울고 싶을 뿐이다’(다산책방)에서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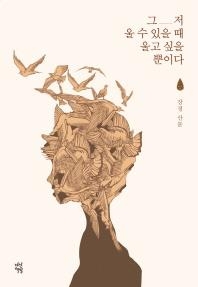

‘슬픔의 윤곽만 물수제비뜨듯 희롱했을 뿐, 더 큰 슬픔의 공명통이 터지기에는 가슴을 가로막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문득, 우는 법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싶어 조금 공허해진다. 인간을 포함, 모든 짐승의 목소리는 결국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전면적 자기 성찰이자 그 고통의 표현이어야 하지 않겠나.’(135쪽)
시인으로 살아온 시간에 대한 회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 최근 작고한 소설가 박상륭과의 일화 등을 통해 문학과 언어에 대한 태도를 정련하는 장면들도 인상적이다. 특히 3일간의 식음 전폐 끝에 써냈다는 박상륭에게 바치는 송가에서 시인은 ‘장례식도 하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도 슬퍼하지도 말라, 차라리 축하나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간 선생에게 “죽음을 감축드린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삶에 대한 자성도, 자각도 없는 시정잡배처럼 떠돌아다니기만 했다는 시인은 9년 전쯤 선생에게 받은 주먹 한 대에 나사못 하나가 박혔다며 이렇게 고백한다. ‘문학이란 결국 삶의 핍진함과 비루함을 돌이키는 방식으로 우주의 전언을 온몸으로 받는 일이라 여겼지만, 이 몸의 용량 부족에 대한 자괴와 유리보다 얇은 영혼의 그릇을 깨뜨려 없애고자 하는 위악으로만 매 순간의 삶을 방기하거나 모욕했다. 그러다가 다시 선생이 들어오시면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저절로 죄어지는 나사못 소리를 들었다.’(172쪽)
시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시를 쓰는가에 시인의 진심은 결국 ‘울음’과 다시 이어진다. ‘그러지(시를 쓰지) 않으면 내가 아프고 삶이 아프고 죽음이 아프고 세계가 아플 것이기에. 모두가 아프면 정말 아파야 할 것들에 대해 아무도 아파하지 않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를 그러한 이생이기에.’(166쪽)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08-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