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익 글모음집 ‘기억의 깊이’


김병익 평론가
1965년 신문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계간 문학과지성의 동인, 문학과지성사의 대표 등을 지낸 그는 저자, 번역가, 편집자, 발행인, 평론가 등 책의 자장 안에서 아우를 수 있는 직업을 두루 거쳤다. 때문에 40여년 전의 글부터 최근에 몇 해간 써낸 글을 묶은 책은 ‘개인의 역사를 통해 보는 가장 미시적인 한국문학사’라 할 만하다. 문학을 전공하지 않아 ‘사생아 콤플렉스’가 있다는 비평가로서의 자의식, 한국 문학의 국제화와 출판계의 미래에 대한 고언, 동세대 작가들에 대한 회고 등 노평론가의 두런거림은 경계 없이 자유롭다.
최근 한강 작가의 맨부커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이 세계 문단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저자는 우리 문학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열정, 고통스러운 현실을 언어를 통해 극복하려는 진지한 고민, 고통이 많았기에 그만큼 구원에 대한 열망도 컸던 한국인의 내면에서 솟아난’ 것이라며 해외 관계자들에게 이를 ‘발견’해 달라고 호소한다.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려온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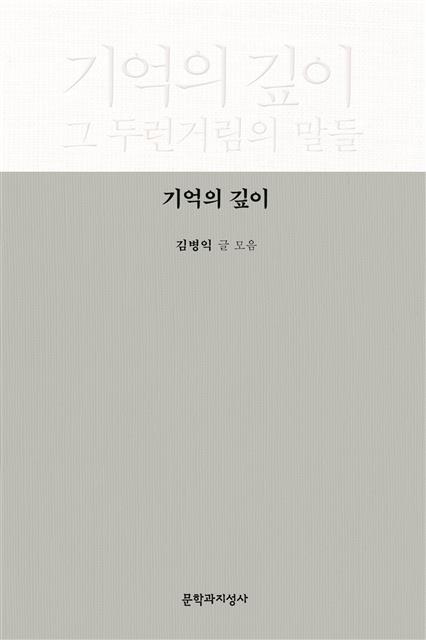
지난해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으로 불거진 문학 권력 논란에 대해선 “현장에서 물러나 거리를 둔 지 오래된 처지여서 잘 분석해내지 못하겠다”면서도 이렇게 가늠한다.
“경제적 부가 넉넉해지면서 상업적 성과가 문학적 성취에 우선하게 되었다는 것, 숱한 문학상과 우수 작품의 선정으로 나타나는 현실적 이권이 문단 내부에 크게 늘어났다는 것, 숱하게 창간된 문학지들이 지자체의 지원과 신인 등장의 대가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 등등 비문학적 타산으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박경리를 ‘문학인으로서의 위엄, 작가로서의 의연함, 인간으로서의 당당함’을 곧추세웠던’ 작가로, 이청준은 ‘복수의 방법으로 글을 선택했고 문학을 통해 이 고통스러운 세계와 삭막한 인간들과의 관계에 용서와 화해를 일군’ 작가로 돌아보는 지점에서는 존경과 애정이 감지된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6-06-2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