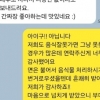‘DNR 표식’ 놓고 윤리적 논쟁
문신 새겨진 응급실 환자 증가의사 존중 놓고 의료진 고민 커져
“문신, 이성적 결정 증거 안 돼”
“의식 불명 땐 유일한 방법” 엇갈려
지난 5월, 미국 마이애미 잭슨 메모리얼 병원 응급실에 의식을 잃은 70대 남성이 실려 왔다. 혼자였고 신분증도 없었다. 호흡기에 문제가 있던 그는 패혈성 쇼크가 오고 있었다. 의료진이 그의 셔츠를 벗기자 쇄골을 따라 영어로 새겨진 문신이 발견됐다. ‘소생술을 하지 마시오.’(DO NOT RESUSCITATE·DNR)

디애틀랜틱 캡처

한 남성의 가슴에 새겨진 ‘소생술 거부’ 문신.
디애틀랜틱 캡처
디애틀랜틱 캡처
현재 미국에서는 환자에게 법적으료 유효한 DNR 서류가 있다면 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다. 문제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는 없이 몸에 문신만 새겼을 경우다. 환자의 진의를 직접 물어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퍼시픽 메디컬 센터에서는 다리를 절단해야 할 환자의 가슴에 DNR 문신이 있었다. 다행히도 이 환자는 의식이 있었고 그는 “소생술을 받고 싶다”고 했다. 가슴의 문신은 수년 전 포커 내기에서 져서 벌칙으로 받게 됐고, 아무도 자신의 문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지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리학자인 로리스 칼지안 아이오와대 교수는 공식 서류가 아닌 문신으로 소생술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은 존중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DNR 서약은 환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끝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의사와 상의한 뒤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DNR 서약이 존중받으려면 이성적인 토론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문신 가게가 토론을 할 만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윤리를 연구하는 해스팅센터의 낸시 벨링어는 “환자는 문신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데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면서 문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시애틀 워싱턴대의 후안 테노는 “누군가가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기 위해 문신에 기대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의료 시스템의 슬픈 폐단”이라면서 “환자들이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7-12-0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