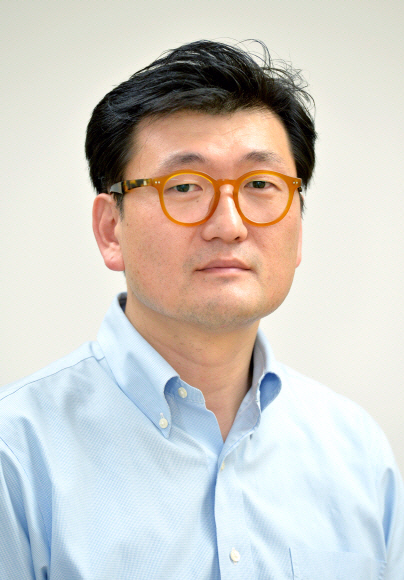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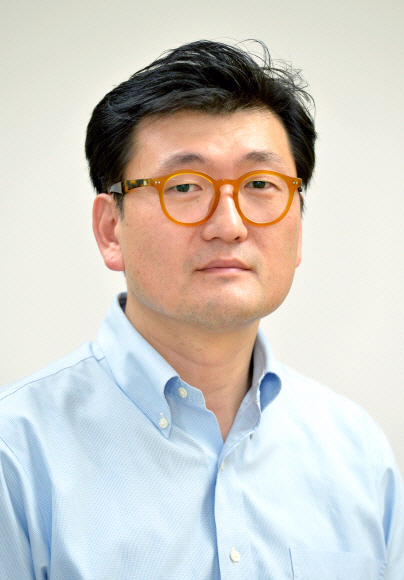
유영규 사회부장
같은 달 17일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60대 목수 B씨가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을 거뒀다. 추락사고로 신고됐지만 동료들의 증언과 부검 결과는 달랐다. 폭염 속 작업을 하다 B씨가 정신을 잃었고 휘청거리다 추락했다는 목격자 증언이 이어졌다. 이날 역시 수은주는 폭염 기준인 33도를 넘어 35도까지 치솟았지만, 공사는 강행됐다. 찌는 듯한 더위에 현장에선 연거푸 탈진자가 나왔다. B씨를 비롯한 현장 동료들은 “폭염을 피할 수 있게 작업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원청은 “일정이 빠듯하다”며 거절했다. “잠시라도 쉬게 해 달라”는 말은 B씨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됐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여름은 잔인한 계절이다.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인 폭염 일수에 비례해 쓰러지고 숨을 거두는 노동자의 수도 늘어만 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재해 노동자는 156명으로 이 중 16.6%인 26명이 사망했다.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에는 급히 올라간 수은주만큼 산재 피해자 수도 폭증했다. 64명이 쓰러졌고 12명이 숨졌다.
올해 상황도 심상치 않다. 질병관리청이 작성한 ‘2021년 온열질환 감시체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무려 436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았고,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특히 폭염 재난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올라간 이달 12일부터 일주일간 열사병 추정 사망자는 3명이나 신고됐고, 하루 평균 환자 신고도 3.5명에서 36명으로 급증했다. 늦은 장마로 한반도의 폭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어나는 피해 속도가 무서울 정도다. 문제는 통계나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희생자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폭염 시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2005년 폭염종합대책을 처음 발표한 이후 담겼던 내용이니 권고만 16년째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장은 폭염경보 땐 1시간에 15분, 폭염주의보 땐 1시간에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그늘막도 설치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실상 단속도 없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선 말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제철소와 같은 ‘고열 작업’에 대한 일부 규정이 있지만 ‘폭염 시 옥외작업’ 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수차례 폭염 시 작업 중지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논의가 있었지만, 경영계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 노동부는 육체노동 강도에 따른 체감 온도 차이를 명시하라는 등 폭염 대응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염 시 작업 중지의 법제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대로라면 올해 역시 노동자가 쓰러지는 비극과 솜방망이 처벌은 반복될 공산이 크다. 국회와 정부가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한여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16년이면 족하다.
2021-07-2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