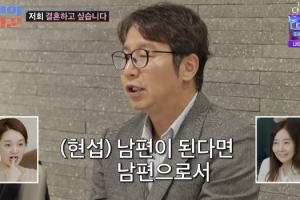빈약한 기초종목 육성 체계 한계
“80년전 손기정 기록보다 못해”“황영조·이봉주 ‘맥’ 어디갔나”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손기정님의 기록이 2시간29분19초였다. 정말 ‘할 말 없음’ 아닌가요.”


손명준은 “아킬레스건이 좋지 않았다. 10㎞ 지점부터 꼬이니까 내 기록(2시간12분34초)에도 훨씬 못 미쳤다”며 “하지만 이게 핑계는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숙였다. 심종섭은 “열심히 훈련했는데 경기 전부터 뒤꿈치가 안 좋았다”며 “비까지 오니 몸이 많이 무거웠다”고 아쉬워했다. 그의 최고 기록은 2시간13분28초였다.
인터넷 여론은 들끓었다. 손기정, 황영조, 이봉주로 이어온 한국 마라톤의 명맥을 뒤로 돌려도 이렇게 뒤로 돌릴 수 있느냐는 질타였다. 동호회 회원도 이 정도 기록은 낸다며 4년 동안 전담 코치 밑에서 훈련한 이들이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반면 기초종목 육상이, 마라톤이 비인기 종목으로 전락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뒤늦게 웬 호들갑이냐고 지적하는 이도 없지 않았다. 선수들을 비난하지 말고 시스템을 뜯어고치자는 지적이다.
하지만 과거 피지배 민족의 울분을 달래주고, 민족의 혼을 하나로 떨쳐 보이던 마라톤이 이렇게 국민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존재로 전락한 것에 분을 삭이지 못하는 이도 있다. 당연히 제 풀에 주저앉는 신세대의 성정 탓이라고 지청구하는 이도 있다.
기자는 육상 전문가 서넛의 의견을 들을까 하다가 그만뒀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이 빠듯한 살림에 5개년, 10개년 계획을 짜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사람의 머리로 내놓을 만한 대책은 다 해봤다. 그런데도 이번 대회에 15명이 출전해 한 명도 결선에 오르지 못하는 등 한국 육상은 뒷걸음질하고만 있다. 분명한 것은 질타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시스템 혁신처럼 거창하지만 막연한 구호로도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6-08-2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