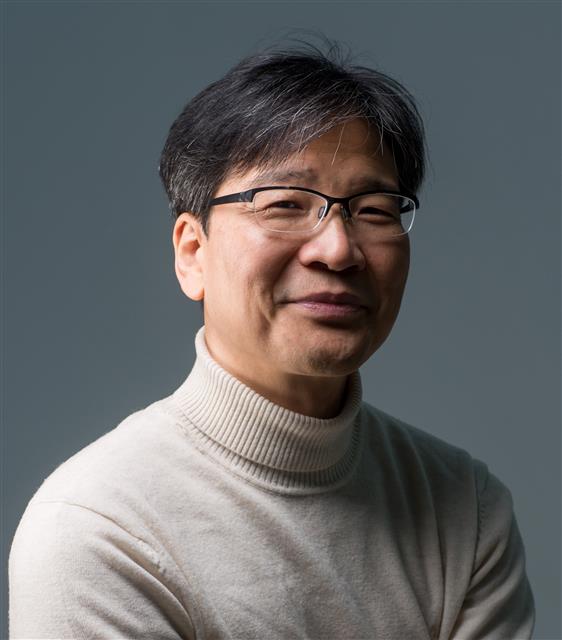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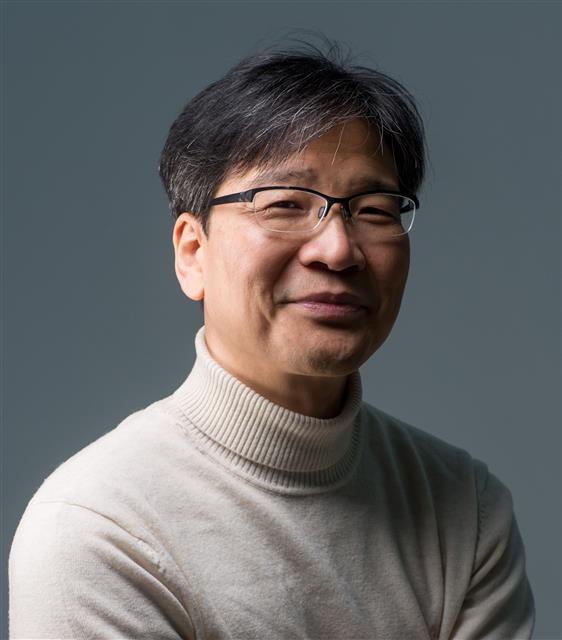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새 선거제도인 준연동비례대표제는 어떤 효과를 지녔을까. 지역구 253개와 비례대표 47개 의석이 여전히 유지되니 얼핏 구심력이 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례 30석이 정당 득표율의 50%까지 연동돼 배분되기에 군소정당들도 욕심을 낼 수 있는 원심력이 가미돼 있다. 이 추가된 원심력이 역동적 정치를 연출하고 있다.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였던 과거와 달리 새 선거제도의 연동 규칙이 통합과 독립 사이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정치권부터 살펴보자. 보수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에 따라 우리공화당, 자유한국당, 새보수당으로 분열돼 있다. 보수 기독교복음주의의 기독자유당과 안철수세력까지 더하면 다섯 부류나 된다. 최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일단 이기고 보자’며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낙관보다는 비관이 우세한 듯하다.
이론적으로 정치세력 간의 통합에는 가치와 정책, 지분, 미래의 기대란 세 요인이 작용한다. 가치 면에서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통합의 원칙에 합의했다지만, 박근혜 쟁점은 여전히 뇌관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공화당과 새보수당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자리하고 있다. 안철수 측도 황 대표의 통합 운동을 ‘묻지마 세력연대’라며 견제구를 날린다. 지분 문제도 난관이다. 통합의 힘은 각 세력 간 지역구 및 비례후보의 지분협상에 달려 있는데 해법이 쉽지 않다. 지분 경쟁에서 뒤처진 세력은 언제든지 튀어나가 새집을 지으려 할 것이다. 미래 기대는 통합의 마지막 걸림돌이 될 수 있다. 3%만 넘기면 최소 5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군소세력들의 분리 독립에 생명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 요인이 결합된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나갈 리더십의 부재는 통합에 대한 회의감을 더욱 부추긴다.
중도와 진보 정치권은 조금 다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보다는 제도가 지닌 원심력을 최대한 이용해 보자는 셈법이 엿보인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역구의 수성과 합당 시너지에 따른 정당득표율 최대화로 제3지대 독자세력화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독자세력화의 오랜 정치노선을 지닌 정의당은 새 선거제도가 지닌 원심력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과적으로 총선 이후의 국회 구성은 각 정치세력이 새 선거제도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당제가 필연적 결과라는 데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에 젖어 있던 우리에게 다당제 아래 정치의 묘미를 살리는 길은 낯설다. 키워드는 ‘협치’일 수밖에 없다.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과반의석을 획득하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다수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해선 거대정당이 이웃하는 정당들과 연합해 다수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이미 여소야대의 환경에서 ‘4+1’의 다수연합을 이뤄 패스트트랙 안건들을 통과시킨 경험을 지니고 있다. 반대파에서 볼 때 불법이니 야합이니 비난할 수 있지만 다당체계에서 다수를 형성하는 합리적인 과정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 많은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으로 인정하고 학습하는 정당정치를 선보였으면 좋겠다. 물론 더 ‘넉넉한 다수’를 만드는 관용을 보였으면 한다.
소수파의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묻지마 반대’는 이제 안 된다. 소수파는 협상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종국에는 다수의 지배에 승복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특히 선진화법이 요구하는 60%의 다수연합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무조건 비토할 게 아니라 최대한 협상하고, 안 되면 당당히 반대표를 던지며, 그 결과로 다음 번 총선에서 심판받는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충실한 행동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2020-01-1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