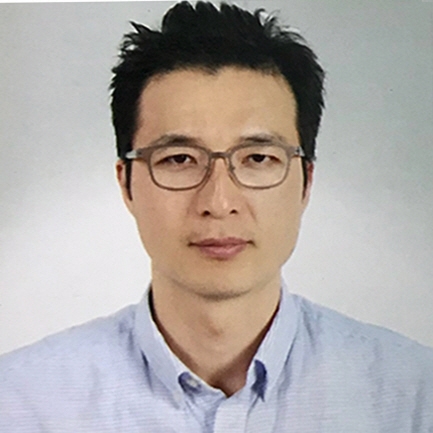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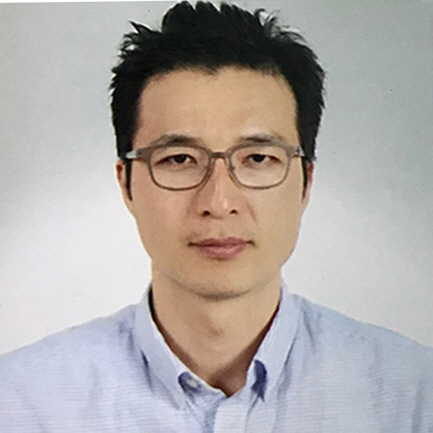
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크레인은 인간을 삼키고 있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한다. 혹시 이 발전하는 스마트기계들이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노동자를 구할 수는 없을까? 과거보다 크레인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붕괴의 주된 원인은 크레인 기술의 한계가 아니다. 예측 못한 강풍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관행의 문제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오랜 하도급 관행이 비용 절감에만 급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청에 재하청이 이어지고 최저가낙찰제가 규범이 되면서 외주업체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크레인을 운영하려 한다. 낡은 크레인을 싸게 수입해 값싼 부품으로 수리하고 날림으로 안전검사를 받는다. 현장에선 운전기사와 통신하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신호수는 쓰지 않고 안전조치를 건너뛴다. 운전기사 없는 무인크레인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무인크레인은 운전기사만 없을 뿐, 인상, 해체와 줄걸이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보호해줄 수 없고 수리와 안전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똑같이 위험하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처럼 예상하지만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노동자를 구하겠다는 말은 없다. 사실 첨단기술이라 해도 하도급 관행이나 부실한 기계 관리까지 해결해줄 수 없다. 흔히 기술혁신은 사회의 변혁을 불러올 것처럼 말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사회의 불합리를 바꿀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때로는 사회의 불합리를 바꾸기는커녕 이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의 인공지능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이용해서 발전하고 있다.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학습하려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레이블된 데이터가 대량으로 필요하다. 이 레이블을 달아주는 이는 미국에선 시간당 4달러, 아프리카에선 시간당 1달러 정도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활용해 발전하고 있다. 극심한 소득불평등 덕분에 인공지능이 스마트해지는 것이다.
영국 감독 켄 로치가 연출한 최근 영화 ‘미안해요, 리키’는 긱 경제(Geek economy)에서 고투하는 한 노동자 가족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사업 기대감에 밴을 구입하고 택배일을 시작한 리키는 화장실 갈 틈도 없이 하루 14시간 일하지만 삶은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 그가 지닌 작은 스캐너 기계는 배송물건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를 감시하고 통제한다. 가족과 소원해지고 새로운 빚도 생겨가던 도중 맞이한 파국에서 온화한 그의 아내는 결국 분노를 쏟아낸다. 그녀는 부서진 스캐너 기계값으로 수백만원을 물어내라는 관리자의 요구에 “망할 기계”라고 부르며 욕설을 퍼붓는다. CES에서 등장하는 온갖 스마트한 기계는 우리를 구원해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리키 가족에게 스마트한 기계는 “망할 기계”일 뿐이다. 며칠 전 논란 많던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다. 비식별조치를 취하면 내 동의 없이도 내 민감정보까지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모아 이루겠다는 혁신이 어떤 의미에서 꼭 필요한 혁신이고 누구를 위한 혁신인지 제대로 답해줬으면 한다. 이 데이터로 만든 기계들이 누군가에게 “망할 기계”가 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타워크레인의 진동 데이터로 사전에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기술은 왜 이들이 말하는 미래 혁신 속에는 없는지 답했으면 한다.
2020-01-1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