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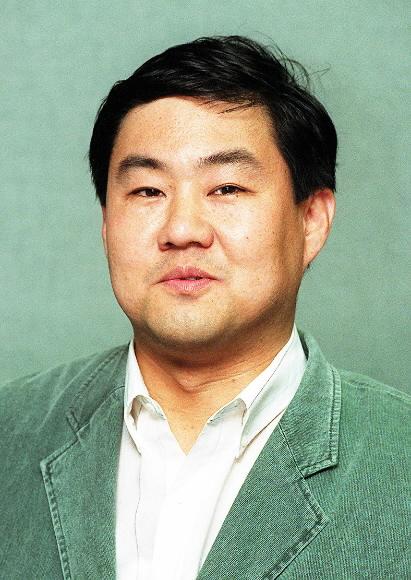
서동철 논설위원
청바지는 어려운 주제다. 이번 전시에도 제시됐지만 ‘청춘과 저항의 상징’으로 청바지의 사회적 역할은 이미 오래전에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바지처럼 사회상을 조망하는 전시는 주제의 역사적 의미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도출된 사회적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그런데 난도가 높은 전시라고는 해도 ‘청바지’전에는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와 세련된 전시기법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메시지가 분명치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반론도 있을 것이다. ‘청춘과 저항’이 전시 키워드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현재까지 양상도 소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시는 관람객의 추억만 자극할 뿐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1970~1980년대 청바지를 입고 학교에 다녔지만 청바지가 왜 저항의 상징이 됐는지는 그저 짐작만 할 뿐이다. 청바지라는 미국문화를 입은 젊은이들이 미국문화원에 불을 지른 아이러니도 해석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저항’을 제외한 것은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청춘과 저항’이라는 키워드에서 ‘저항’을 도려내니 남은 것은 ‘청춘’뿐이다. 청춘이란 다분히 상업성에 힘입은 개념이니 다국적 청바지업체 브랜드 이미지만 부각시킨 전시가 된 것은 필연이다.
민속박물관 전시가 주제를 파고드는 열정보다는 디자인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박물관의 디자인 영역은 중요하지만 기획 의도를 뚜렷이 구현하는 역할을 했을 때 가치를 발하는 것이다. 지난해 ‘종가’(宗家) 특별전은 ‘IDEA 디자인 어워드 2014’에서 최종심에 올랐을 뿐이지만 상을 받은 것처럼 선전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디자인만 내세우는 것은 콘텐츠 품질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한다. ‘청바지’전도 다르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다.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4-10-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