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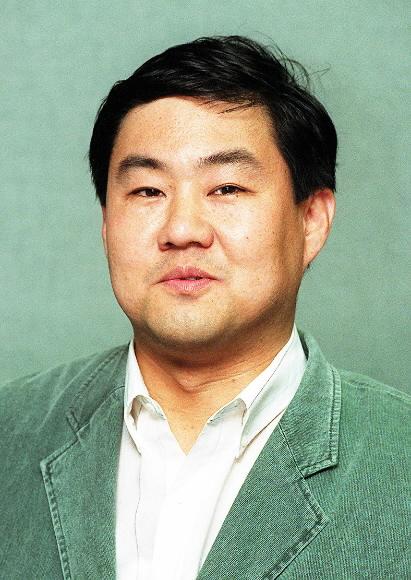
서동철 논설위원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산업적 측면에서도 문화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이득을 얻는 윈윈전략이다. 소비자의 저변을 늘리는 것은 공급자가 반드시 해야 할 장기 투자일 것이다. 단기적으로도 불리할 것이 없다. 우리 영화관의 평균 객석 점유율은 30%선이다. ‘문화가 있는 날’ 객석 점유율을 60%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반값이라도 손해볼 일은 없다. 몇몇 대형 멀티플렉스가 고민 끝에 ‘문화가 있는 날’의 참여를 결정한 것도 이런 손익계산의 결과였을 것이다.
‘문화가 있는 날’의 첫 단추는 제대로 꿴 것 같지만 고민도 적지 않다. 초기 단계부터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조만간 참여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국립박물관도 입장료를 폐지하자 관람객이 한없이 늘어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형 ‘문화가 있는 날’은 한계가 분명하다.
해법은 명확하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경꾼에 머물지 않고 문화의 주체가 되는 날이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부터 합창단 같은 동아리를 만들어 분위기를 선도하면 어떨까. ‘문화가 있는 날’에는 주민들과 어울려 공연을 할 수도 있다. 세종시가 아직은 문화가 없는 고장이 아닌가. 학창시절 합창단원이었다는 유진룡 장관이 참여하면 더욱 좋다.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문화부의 직원 밴드도 활동폭을 넓혀야 한다. 기업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경영자 입장에서도 공연 관람을 돕겠다고 직원들을 조퇴시키는 것에는 흔쾌하지 않겠지만, 직원들의 사내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소리소문없이 늘어나고 있는 주민들의 문화 동아리도 ‘문화가 있는 날’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기타나 색소폰, 전통음악, 노래를 하는 아마추어 동아리는 연습이나 공연 장소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전국의 국공립 공연시설은 ‘문화가 있는 날’ 자체 기획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이날 하루만이라도 작은 공연장은 주민 동아리에 과감하게 무료 개방하는 것은 어떨까. 이들의 공원이나 거리 공연도 적극 부추겨 주민이 주인공인 날을 실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듯 문화 소비자가 문화의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문화가 있는 날’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4-02-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