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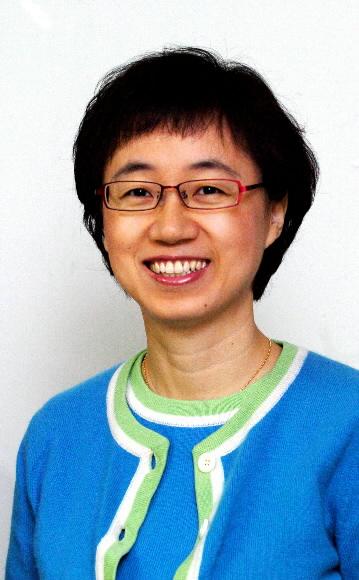
최광숙 논설위원
의학의 도움을 살짝 받아 외모 콤플렉스에 싸인 이들이 자신감을 찾고 당당히 살아간다면 성형 수술대에 오를 만하다. 하지만 성형 수술로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않은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성형 열풍’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한 40대 여교수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지가 마비돼 11개월째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한다. 양악수술 등 성형 수술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하는 이들까지 있다. 심지어 양악수술 후 며칠 만에 숨진 젊은 여성들 소식도 심심찮게 들린다.
너도나도 성형 미인을 꿈꾸면서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성형 시술 건수가 연간 13.5건으로 세계 1위다. 이 수치는 근본적으로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일그러진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일 수도 있겠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병원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미국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빈도를 조사해 봤더니 캘리포니아 지역의 척추수술 건수는 인구가 비슷한 뉴욕보다 두 배나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춘성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외과의사 수만큼 수술이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의사의 과잉 공급이 불필요한 과잉 수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성형 시술을 집도하는 병·의원은 전국 4000여개로 추정된다. 서울의 이른바 ‘뷰티벨트’라 불리는 강남에만도 수백개의 성형외과가 몰려 있다. 병원들은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고객 유치전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성형 효과를 거짓·과장 광고해 소비자들을 유혹한 전국 13개 성형외과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사각턱뼈를 깎고도 다음날 출근’, ‘주름 한번 수술로 90세까지’와 같은 부풀린 광고 문안들이 고객들을 병원으로 유인한 것이라고 한다.
병원이야 광고 문안을 시정하면 그만이지만 엉터리 광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교묘하게 규제를 빠져나간 광고까지 감안하면 이제 과대·허위 의료 광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엄히 처벌해야 할 때다. 자칫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잘못된 의료 광고로 인한 책임을 환자들에게만 지우기에는 그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커 보인다.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3-12-2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