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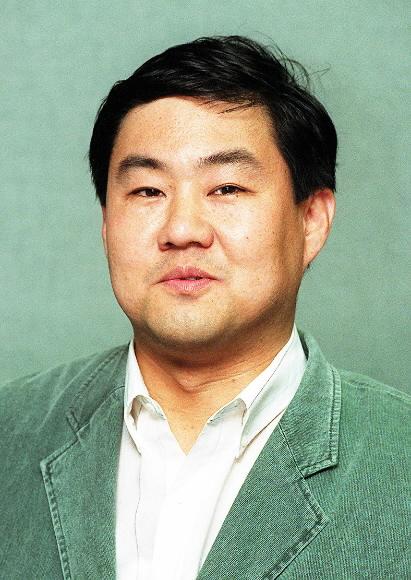
서동철 논설위원
이후 사물놀이가 전례 없는 성공가도를 달린 것은 비슷한 엑스터시를 공유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사물놀이는 1983년 드디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으로 진출했다. 4000석 남짓한 초대형 극장이었던 만큼 공간사랑에서와 같은 물리적 울림은 없었다. 대신 소극장에서는 불가능했던 상모돌리기 같은 판굿이 등장한 것은 새로운 볼거리였다.
객석 한복판에서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땋은 색동저고리 금발 소녀가 끝없이 기립박수를 치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사물놀이가 세계적 보편성마저 갖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고, 실제 그렇게 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남사당 출신의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 김용배가 만든 타악 앙상블 사물놀이는 어느 사이 보통명사가 됐다.
그렇다고 사물놀이가 찬사만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민속학계는 무대와 관객을 분리시킨 사물놀이가 두레패와 구경꾼이 한데 어울리는 풍물굿의 생명력을 쇠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동체의 신명을 풀어내던 풍물굿의 전통은 사라지고 무대에서 관객을 내려다보는 사물놀이만 남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다.
공간사랑의 사물놀이는 풍물과 무속의 음악적 요소를 타악사중주단의 무대 공연 레퍼토리로 정밀 가공한 것이었다. 본질을 더욱 가다듬고 변두리 활동에 눈을 돌리지 않은 채 풍물굿과는 분명히 다른 독자적 영역을 유지했다면 비판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물놀이 단체가 생겨났음에도 본질에 충실한 공연은 이제 눈을 씻고도 찾기 어렵다. 무지한 사물놀이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민속학계의 걱정처럼 전통문화에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사물놀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위기다. 실상을 점검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데 원조 사물놀이 멤버들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
dcsuh@seoul.co.kr
2013-07-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