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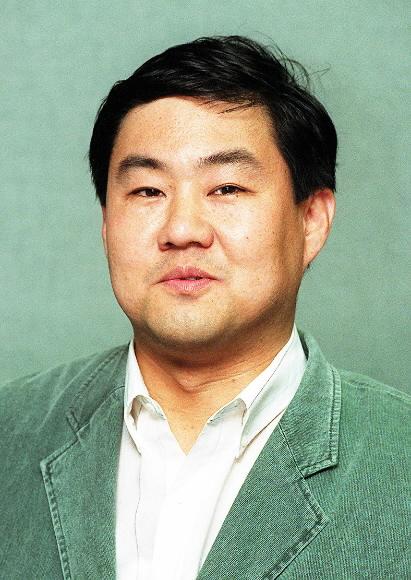
서동철 논설위원
요즘 책을 읽다 보면 ‘지금 여기’라는 표현이 종종 눈에 들어온다. ‘내가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공간의 현재 양상’쯤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어쩐지 ‘문제의 개선’이라는 실천적 노력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상대적인 개념이 ‘그때 거기’다. 민속학자들은 시간적 거리가 있는 과거를 일컬을 때 쓰는 듯하지만, 아무래도 주체가 아닌 객체로 현상을 바라본다는 느낌이다. 새삼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민속박물관의 역할 역시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를 포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속박물관 정문을 들어서 장승동산과 개항기상점, 추억의 거리를 지난 야외전시공간과 상설전시는 만족스럽게 과거를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와 기획전시, 교육 기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현재의 문제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여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이 될 것이다. 최근 민속박물관 내부에서부터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다문화 갈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천적 노력도 시작됐다. 2009년 ‘다문화 꾸러미’가 출발점이라면 지난해에는 미얀마 출신 이주여성의 삶을 담은 ‘내 이름은 마포포, 그리고 김하나’ 전시회도 그 연장선상이다. 아시아판 움직이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다문화 꾸러미’는 이미 몽골과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꾸러미가 다문화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완성된 한국 꾸러미는 각종 해외 홍보에 활용 가치도 매우 높아 주목받고 있다.
과거를 담고 있지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박물관의 본령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민속박물관의 역할 또한 과거와는 적지 않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과거의 이미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박물관 이름이 갖는 한계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지난해 264만명의 관람객을 모아 세계 15위 박물관에 오를 만큼 이미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앞으로 ‘민속’보다 좀 더 폭넓은 사회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명칭과 조직 체제를 한번쯤 고민해도 좋을 것 같다.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3-07-1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