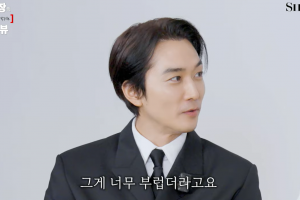내일 ‘6번째 윙드풋’ US오픈 개막

머매러넥 게티/AFP 연합뉴스

18일(한국시간)부터 미국 뉴욕주 머매러넥 윙드풋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제120회 US오픈 골프대회는 난코스로 악명 높다. 이 장소에서 지금까지 5차례 US오픈이 열렸는데 언더파 스코어로 우승한 사례는 1984년 퍼지 졸러(미국)의 4언더파가 유일하다. 좁고 구부러진 페어웨이를 벗어나면 15㎝ 길이의 깊고 질긴 러프가 있어 정확한 티샷이 아주 중요하다. 사진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16일 열린 대회 연습라운드에서 어프로치샷을 하고 있는 모습.
머매러넥 게티/AFP 연합뉴스
머매러넥 게티/AFP 연합뉴스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관하는 제120회 US오픈 골프대회가 1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머매러넥의 윙드풋 골프클럽(파70)에서 막을 올린다. 코로나19 탓에 석 달이나 미뤄진 US오픈은 앞서 119차례 동안 ‘코스와의 싸움’이 전통처럼 이어졌다.
특히 역대 6번째로 US오픈을 유치한 윙드풋 골프클럽은 지금까지 치른 역대 51곳 대회 코스 중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이곳에서 치른 5차례 대회에서 언더파 우승자는 36년 전인 1984년 대회의 퍼지 졸러(미국) 단 1명뿐이었다. 언더파로 대회를 마감한 선수도 졸러를 포함해 연장전에서 승부를 펼친 그레그 노먼(호주·이상 4언더파) 등 2명 외엔 없었다.

US오픈 홈페이지 제공

일본의 골프스타 이시카와 료(오른쪽)가 1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머매러넥의 윙드풋 골프클럽 서코스에서 가진 제120회 US오픈 골프대회 연습라운드 도중 페어웨이에서 벗어난 공을 찾고자 발목까지 차오르는 15㎝ 높이의 러프에서 헤매고 있다. 긴 러프와 좁은 페어웨이, 유리알 그린으로 무장한 올해 US오픈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36년 만의 언더파 우승자 탄생 여부다.
US오픈 홈페이지 제공
US오픈 홈페이지 제공
그렇다면 윙드풋은 왜 어려울까. 우선 페어웨이가 좁다. 업다운이 심하지 않아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개미허리처럼 폭이 좁은 데다 굽은 곳이 많다. 자칫 티샷이 페어웨이를 벗어나면 발목을 덮는 15㎝ 깊이의 두껍고 뻣뻣한 러프가 공을 삼킨다.
16일 연습라운드에 나선 우즈는 18번 홀(파4) 티샷이 페어웨이 왼쪽 러프에 떨어지자 곧바로 공을 손으로 집어들어 페어웨이로 빼낸 뒤 다음 샷을 했다. 긴 데다 질기기까지 한 러프에서 어설프게 샷을 하다간 자칫 손목을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세계 1위 더스틴 존슨(미국)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이시카와 료(29)는 러프에 빠뜨린 공을 찾느라 10분 이상을 허비해야 했다. 우즈는 기자회견에서 “윙드풋은 내가 경험한 곳 중 가장 어려운 코스 중 하나”라면서 “난도 면에서 아마 이곳과 오크몬트 컨트리클럽이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볼이 떨어질 만한 지점에 아가리를 벌린 벙커도 수두룩한 데다 ‘유리판 그린’에도 맞서야 한다. USGA는 올해 그린을 더 단단히 다지고 잔디를 짧게 깎아 유리판처럼 만들었다. 1m짜리 퍼트도 우습게 봤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잭 니클라우스(미국)는 “윙드풋의 그린은 내가 겪어본 가장 어려운 그린”이라고 말했다.
장타와 정교함의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은 엇갈린다. 올해 체중을 20㎏이나 불려 괴력의 장타를 휘두르는 브라이슨 디섐보(미국)는 “공이 러프에 떨어진다 해도 난 드라이버를 힘껏 때리겠다”고 ‘닥공’을 선언했다. 반면 PGA 투어의 대표적인 장타자이자 이 대회 ‘빅4’ 중 한 명인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러프에 떨어지는 350야드짜리 장타보다 페어웨이를 지키는 편이 낫다”고 공략법을 밝혔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20-09-1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결혼 안 해도 가족” 정우성 아들처럼…혼외자 1만명 시대 [김유민의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1/25/SSC_20241125094249_N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