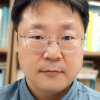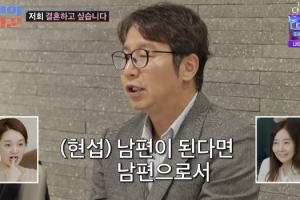범죄장치와 같아… 강제 사실상 불가능, 당사자 동의받아도 소송 막기 어려워
정 총리 주재 장관 회의서 결론 못 내“감염병 예방 목적과도 안 맞는 정책”

서초구 제공

서초구 직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지난 1일 서초구에 사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초구 제공
서초구 제공
손목밴드는 격리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장치다. 격리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능적으로는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전자팔찌’로 불린 이유다. 이러한 전자장치는 인신 구속적 성격을 띤다. 그렇다 보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도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만 전자발찌 착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손목밴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자가 또는 시설 격리 등 강제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신체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법령 개정을 해도 시간이 걸리고 소급 적용이 안 된다. ‘과잉 입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장)는 우려도 나온다.
당사자 동의를 받는다 해도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비난받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동의’만으로 인권침해 소지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지적(이동찬 변호사)이 나온다. 동의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해 주는 ‘당근’과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향후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검사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채찍’ 정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 누구나 진단·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채운다고 하면 ‘내가 감염됐다는 게 확실하지 않은 한’ 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 목적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