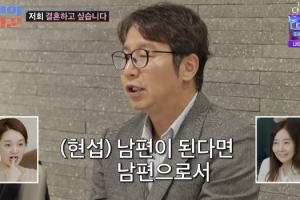[시는 위로다] <7> 이소연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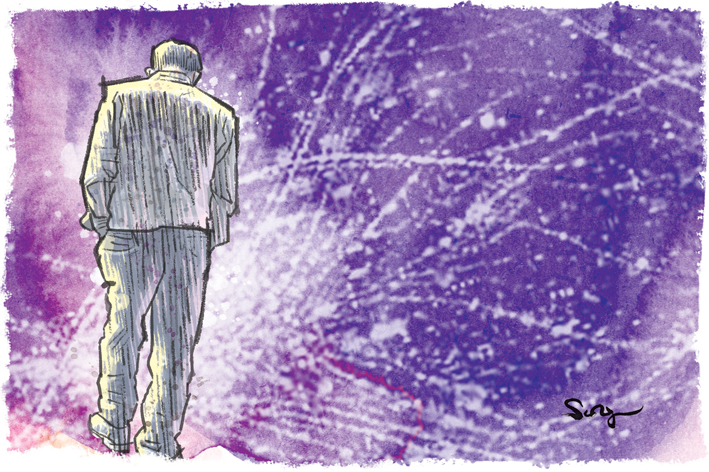
일러스트 김송원 기자 nuvo@seoul.co.kr
문 없는 집은 없어서
나의 집이 먼저 나를 이끌고 외출하였다
집은 송장나무*를 찾아가 송장같이 지내는 법을 묻는다
꽃잎은 왜 아래만 바라보는 걸까?
개미는 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갈까?
나만 이러는 게 아니라서
비오는 날 우산을 챙긴 사람처럼 좋았다
굽 높은 신에도 바짓단이 젖고
얼굴을 들면 세상이 물에 잠겼다
약(藥)이 된다는 말을 좋아했다
서로의 반대쪽 손등을 부딪히며 걷는 일은
나도 아는 걸 너도 안다는 뜻이어서
말하지 않아도 숨이 차올랐다 우리는
기차에서 내려 죽은 노루를 본 우리는
“치워주고 갈까?”
아직 남아있는 온기를 치우며 슬퍼하고 있다고 믿는 우리는
나에게서 너를 구하려고 멀어질 때가 있었다
멀리서 사랑하는 일은
비처럼 그친다지
“빗소리 들려?”
멈추지 못하는 호흡들, 헉, 헉, 발밑의 집들이 보인다
지붕, 지붕, 지붕, 없는 것들이 꿈틀거렸다
우리는 초록을 흠향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상산나무


이소연 시인
1983년 경북 포항 출생. 2014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 출간.
2020-05-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