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우, 7편 중단편 소설집 ‘연대기, 괴물’ 펴내
“‘유해 발굴자’라니까 내가 괴물이 된 것 같아 끔찍하던데(웃음). 내게 역사의 폭력은 가공의 일이 아니라 생래적으로 각인된 이야기예요. 되새기는 게 고통스럽지만 내쳐지지 않고 오히려 절실하게 매달리게 돼요. 세상의 난폭함을 유독 견디지 못하는 체질이라서랄까요.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일로 고통받고 있다면 ‘몰랐다’고 말하는 대신 ‘내가 할 일이 뭔가’라는 질문을 작품을 통해 던지고 싶은 거죠.”

소설가 임철우
●역사적 비극 연원 파내려가는 집요한 글쓰기로 정평
소설 속 인물들은 대부분 죽음을 앞두거나 이미 죽음으로 건너간 이들이다. 아들과 아내를 잇따라 잃고 개까지 안락사시키며 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남자(흔적), 쪽방촌에서 혼자 죽음을 맞으며 서서히 부패해가는 노인(세상의 모든 저녁) 등 서러운 생의 연대기를 작가는 기억하고 애도한다.
표제작인 ‘연대기, 괴물’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처참했던 사건들에 대한 충실성, 이 윤리에 관한 한 임철우를 따라갈 작가는 없다”(김형중 평론가)는 평에 가장 들어맞는 작품이다. 긴 세월 무연고자로 살아온 송달규가 지하철에 뛰어들며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한국전쟁부터 보도연맹 사건, 베트남전,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까지 현대사의 악몽을 집약한 ‘우리 시대의 초상’이다. 송달규의 일생은 시작부터 어긋났다. 보도연맹에 가입된 섬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몽둥이패(서북청년단)의 우두머리 ‘갈고리’가 어머니를 성폭행해 태어난 그는 생모가 떠난 뒤 외조부모에게서 자라났다. 베트남전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기도원에서 25년을 버틴 뒤 노숙자로 거리를 전전한다. 세월호 참사 분향소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마주한 그는 종편 방송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리본을 제거하겠다고 나선 팔십대 노인이 생부임을 직감한다. 내내 그를 환각 속에서 괴롭혔던 괴물은 검은 아가리 같은 지하철 터널 앞에서 정체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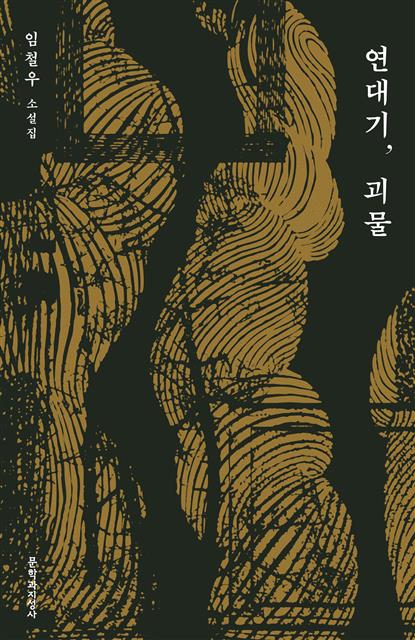
가해와 피해, 죽음과 죽임이 한 몸으로 뒤엉켜 있는 혼돈상은 한 시대의 민낯이자 폭력이 지닌 복잡다단한 얼굴이기도 하다. 이 무저갱 같은 세상에서 작가는 ‘기억’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이자 책임임을 전편에서 드러낸다. ‘기억은 이미 죽은 이들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슴 시리고도 유일한 관계이다’라는 수전 손택의 말을 작가의 말에 대신 내보낸 것도 그 때문이다.
●“어둠 많이 볼수록 찰나 빛의 아름다움 알게 돼”
소설 속에서 고통의 되새김질, 애도와 회한의 시간은 끝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타인의 상처를 겁내지 않고 기꺼이 손뻗어 어루만지는 증언의 손길은 이 어둠에도 끝이 있으리란 믿음을 옅게 드리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할 때 결국 우리는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살이도 너무 팍팍하고 힘든데 소설까지 칙칙하고 슬퍼서 (독자들에게) 미안하긴 해요(웃음). 하지만 어둠을 많이 볼수록 찰나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되잖아요. ‘이상하지,/살아 있다는 건,/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빈 벌판에서 차갑고도 따스한 비를 맞고 있는 것 같지’란 최승자의 시처럼 말이에요.”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03-22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