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상황 따라 층간소음 민감성 달라
입주자 선정 때 소음 민감도 등 고려하고
아파트 설계에 복층 구조 적극 반영하길
국토교통부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를 위해 차음성능 미달 시 관련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시공사의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공표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대책의 하나로 공동주택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0㎜ 상향(210→250㎜)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만족시키는 1등급 바닥구조 하한 소음 기준을 49dB에서 37dB로 개정하는 기준을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음이 약 10dB 감소되면 우리가 느끼는 소음의 크기는 절반 정도 감소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대책이 최근 난방 효율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바닥난방 구조는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단열재 또는 완충재를 설치하고 모르타르를 40㎜ 정도 타설한 다음 난방 배관을 하고 다시 모르타르를 40㎜ 설치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완충재 위에 난방 배관을 설치하고 바닥 모르타르를 70-80㎜ 두껍게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난방배관 위 모르타르 두께가 두꺼워져서 퇴근 후에 바닥난방 시스템을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까지는 지금보다 더 시간이 걸려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축열층이 증가해 공동주택 난방에너지가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물 부문에서 소비되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3%가 공동주택 난방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민원을 다루고 있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4년 2만 641건에서 2023년 3만 6435건으로 약 57% 증가했다. 물론 최근에 국내 주거 형태에서 공동주택 거주자의 비율이 전체 주거 건물의 50%를 넘어설 만큼 공동주택 수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문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건설되면서부터 시작됐으며, 정부가 그동안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개인차가 큰 것이 음에 대한 감각이다. 개인별로 상황별로 달라진다. 사람마다 소음에 대한 수용도가 다르기도 하지만 소음 발생 상대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공동주택의 물리적 차음 성능만 향상시킨다고 해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어느 대학 기숙사의 룸메이트 선정을 위한 입주자 설문에 룸메이트의 코골이에 대해 잠을 잘 잘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문항이 있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왜 우리 공동주택 입주자 선정에는 반영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추첨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입주자의 성향이나 수용도를 조사해 입주 위치를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필자는 이전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복층아파트 구조를 제안해 왔다. 아파트 평면을 복층으로 해서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행동이 필요한 실을 2층에 배치해 가구 내 소음이 다른 가구로 전달되는 걸 줄이자는 것이다. 모든 아파트를 복층으로 건설할 필요는 없겠지만 소음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복층아파트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층간소음 문제를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물리적 성능 기준의 강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발상의 전환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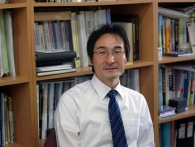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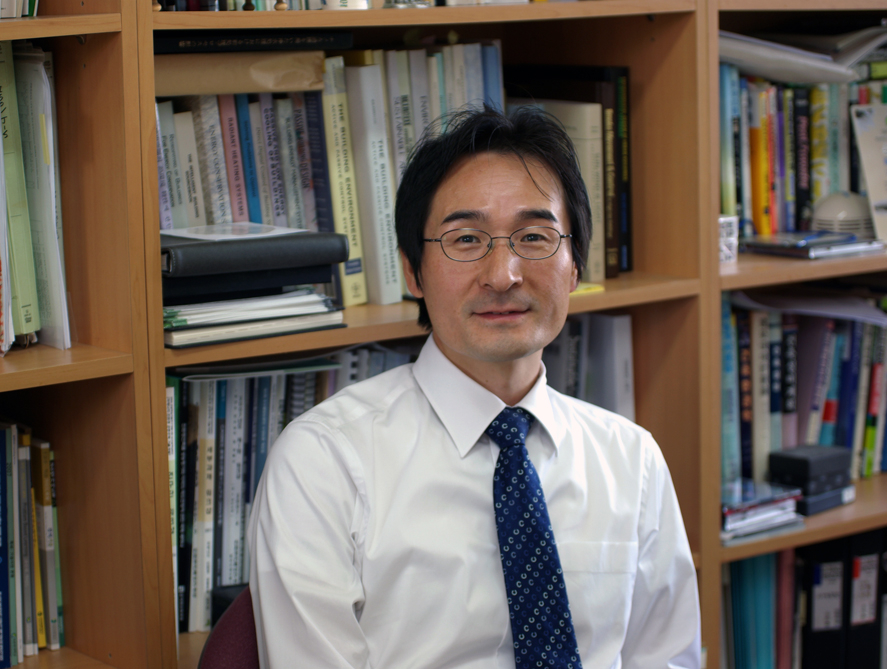
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024-04-3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