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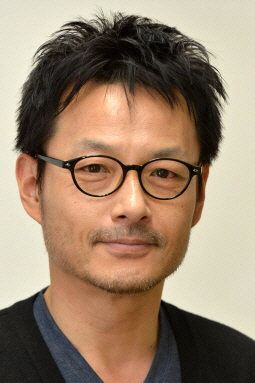
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5년 뒤 김대중 정권이 몰고 온 격랑은 더 컸다. 정권 교체의 완력을 절감했다. 주요 정부부처와 사정기관, 공공기관 심지어 주요 기업과 언론사 등의 인사에까지 서남풍이 거세게 몰아닥쳤다. 5년짜리 대통령이 내 자리, 내 인생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렷이 목도했다.
노무현 집권은 ‘패권’이 무엇인지를 일깨웠다. 3김 정치가 깔아놓은 지역분할구도 위에 이념분할구도가 얹어지면서 나라는 바야흐로 다중분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강남좌파’가 등장했고 영남보수와 영남진보, 호남진보와 호남보수가 본격적으로 담을 쌓았다. ‘우리’와 ‘저들’을 가려내는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피아 식별이 일상이 됐다.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의 영포라인과 박근혜 정부 진박 세력이 보여준 인사 전횡은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세력과 세력의 권력 쟁탈전임을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간 10년 터울로 두 차례 정권교체를 겪는 과정에서 어김없이 강고한 ‘완장’들이 등장했고, 이들의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인해 누구는 빨려들고 누구는 밀려났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공직사회의 움직임은 분주해졌다. 교수 사회는 넘쳐나는 폴리페서들로 점점 번잡해져 갔다. 심지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방송토론 주요 패널들마저 면면이 바뀌었다. 모두 기형정치의 변주들이다.
언제부턴가 소통은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의 것이 됐다. 지역과 이념, 계층과 세대 가릴 것 없이 담장 밖은 죄다 말이 안 통하는 ‘저들’뿐이다. 누구에겐 막말이 누구에겐 ‘사이다 발언’이다. 증오와 분노를 넘어 모두가 지친 지금의 피로사회, 단절과 불신의 사회는 그렇게 정치 완력이 그려온 궤적 위에 만들어졌다.
TV토론에서 ‘적폐’와 ‘패권’을 운운한 대선 후보들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은 공허하다. 패권세력, 적폐세력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입으로는 ‘협치’와 ‘통합정부’를 말하는 그들의 표리부동만큼이나 헛헛하다. 그런 자세로 어떻게 통합을 이루겠느냐고 질타하지만, 기실 알게 모르게 편을 먹고, 그 속에서 ‘담장 밖 이해 못할 사람’들을 탓하며 게으른 넋두리를 되뇌는 건 그들이 아니라 우리인지 모른다.
초유의 안보 위기와 고령화의 시한폭탄 앞에 섰다.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외환과 내우다. 사흘 남겨 놓은 19대 대선은 이미 배척의 선거가 됐다. 아무개가 대통령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노기(怒氣) 속에 새 대통령이 나온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라리 벼룩 세 마리를 끌고 가는 게 쉬울 상황이다. 이런 분열사회를 한낱 국민통합기구 같은 정치적 미장센으로 묶을 수 없음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다. 국무총리를 다른 지역 출신으로 삼는다고 탕평이 되지도 않는다.
모두의 용기가 필요하다. 배격의 기저에 깔린 ‘저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신념이라 믿는 아집도 한 번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만큼 ‘저들’을 인정하는 관용도 요구된다. 후보들부터 나서야 한다. 파부침주(破釜沈舟), 타고 온 배부터 버리길 바란다. 대선 때 몰려든 인사를 멀리하고, ‘저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우리’의 지지로 당선됐지만 ‘저들’의 박수 속에 떠나는 대통령을 꿈꿔야 한다. 대통령 되더니 사람 달라졌다, 속았다는 극언까지도 겁내지 말아야 한다. 어느 정권만큼은 안 된다는 각각의 ‘우리’들도 모두의 대통령이 된 당선자에게 통합의 길을 터줘야 한다. 자신을 고릴라라고 멸시한 자를 국방장관에 앉힌 링컨과, 그렇게 멸시한 자의 부름에 응한 윌리엄 스탠턴, 둘 다 우리에겐 절실하다.
jade@seoul.co.kr
2017-05-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