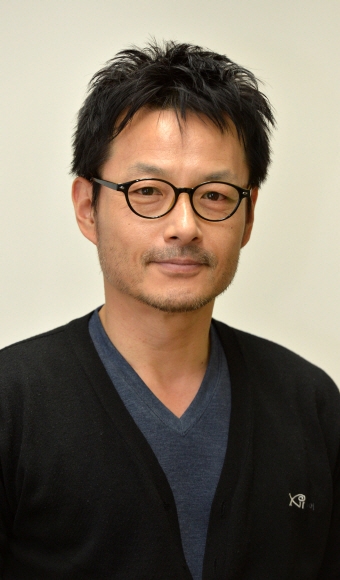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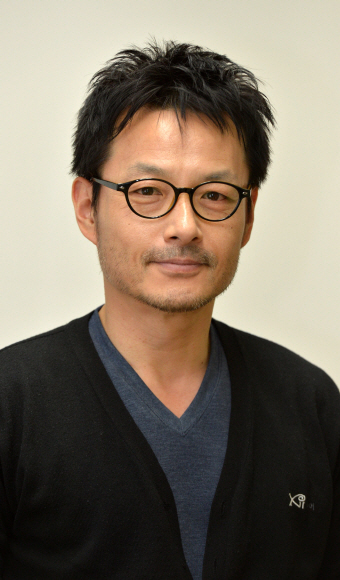
진경호 논설위원
생면부지의 한 여인으로 인해 저녁이 있는 삶을 빼앗긴 지 몇 달 된 기자는 그렇다 치고 저녁 술자리 장삼이사 셋만 모이면 죄다 ‘최순실’이니, 이 땅의 신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씨가 대체 국정의 어디까지를 농단했는지, 이로 인해 이 나라 국정이 어떻게 비틀렸는지는 특검이 뒤지고 법원이 따지면 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도 머지않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갈릴 것이다. 어쩌면 두 달 뒤쯤엔 이 폭풍우가 잦아들 것이라고도 한다.
물음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는 것이다.
‘최순실’이 던진 담론의 화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마르크스는 역사는 한 번은 위대한 비극으로, 한 번은 너절한 희극으로 반복된다고 했다는데, 어찌 된 영문이길래 우리의 대통령사는 예외 없이 집권 4년차의 너절한 비극으로 점철되는지 우리는 지금도 그 답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태생적 폐해라고도 하고,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지 않아서라고도 하지만 저마다 제 입맛대로 내놓는 주장일 뿐이다. 한 번도 우리 정치는 당리당략을 배제한 채 대통령 권력을 논한 바가 없다.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헤집는 동안 대통령 주변의 그 많은 측근과 실세들이 청맹과니 행세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찌해야 우리가 이런 청맹과니들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있는 건지, 사용 연한을 다한 87체제를 무엇으로 대체해야 후대에 욕을 먹지 않을지도 고통스럽게 묻고 다투며 답을 찾아야 한다. 다른 시공(時空)에 사는 듯 주말이면 서울 도심을 둘로 쪼개는 ‘촛불’과 ‘태극기’는 대체 하나가 될 수 있기나 한 것인지, 허구와 가짜가 판치는 ‘탈(脫)진실’(post-truth)의 시대에 언론은 무엇으로 권위를 되찾고, 대중은 무엇으로 부러진 잣대를 바로 세울지도 고민해야 한다.
‘최순실’을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이 낳은 낯부끄런 사고쯤으로 간주한다면 우리 사회의 총체적 적폐는 언제든 집권 4년차의 필연적 불행을 다시 불러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으로 문제를 좁히면 그만큼 답은 멀어진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이 허물어지고, 능력 대신 돈과 인맥이 성패를 가르고, 부러진 사다리 앞에서 부여잡을 것이라곤 절망과 증오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든 연줄을 찾아 끼리끼리 묶고 우리는 절대 남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외치며 저네들과 우리들을 나누고 싸워 이겨야 하는 패당적 분열 구조의 이 반칙 사회가 ‘최순실’을 잉태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적수공권의 성공 신화를 일군 화장품 업체 대표 정운호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50억원에 사서 판검사들에게 로비를 벌이고, 20년 가까이 본 적 없는 동창 사업가에게 친구야 하며 술집 애인 방값까지 뜯어내 흥청댄 전도유망 검사가 구치소에 갇혀 있는 현실이 그 당위를 말해 준다. 소셜미디어의 홍수 속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객관적 사실 전달보다 정파적 주장을 앞세운 채 ‘단독 오보’까지 서슴없이 날리고, 종합편성채널로 출발한 종편이 종일편파방송으로 변신해 가며 여론 지형을 뒤틀고 있는 작금의 언론 환경이 지금의 왜곡 사회를 강화해 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정치다. 정권교체니 정치교체니 하는 말씨름으로는 ‘최순실’을 지울 수 없다. 정권교체만으론 절대 정치를 바꾸지 못하고, 공허한 정치교체 주장으론 절대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등 차기를 책임지겠다는 인사들이라면 이제라도 ‘최순실’을 정권교체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교체의 목적에 두고 싸우기 바란다. 그래야 4년 또는 5년 뒤 ‘최순실’을 만나지 않는다.
jade@seoul.co.kr
2017-01-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