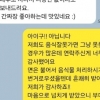중국 요인 배제하면 대책에 한계… 정부, 중국 실천 적극 끌어내야
역대 관측 사상 최악을 기록한 지난달 고농도 미세먼지의 75%가 우리나라 밖에서 날아들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11~15일 5일간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가장 심했던 15일은 국외 요인이 81.8%까지 치솟았다.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서풍이 불었고, 중국 주요 도시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어떤 미세먼지 대책도 중국 요인을 배제할 경우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 셈이다.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중국의 영향은 자명해 보인다. 지난달 10, 11일 중국 산둥반도와 북부 지역에서 생긴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풍이 불면서 중국발 오염물질이 한반도로 대거 유입됐고, 기류 정체로 오염물질이 한반도를 빠져나가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3일 다시 중국 북부 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밀려들면서 오염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 기간에 중국에선 하루 앞선 10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다가 15일 모두 해소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국은 지난해 말과 올 초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부터 수년간 대기오염 방지 계획을 실행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악화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베이징은 오염 정도가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나 2017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58㎍/㎥로 지난해 서울의 2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북서풍이나 서풍이 불면 여전히 중국의 오염물질이 한반도로 밀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진행한 공동 연구에서도 한반도 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은 외부에서 날아온 것이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공조에 적극 임해야 한다. 지난달 한·중 두 나라는 환경협력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과 대기 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중국이 기울여 온 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더 강화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정보 공유나 기술 교류 수준을 넘어 중국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나서도록 적극 촉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적·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소극적인 저자세로는 중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실천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2019-02-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