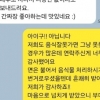현재 중 3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방안이 어제 발표됐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을 30% 이상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와 수학을 공통 및 선택 과목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수능 상대평가 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와 한문을 절대평가 과목에 추가한다. 폐지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입시 개편안은 이쪽 저쪽의 여론을 어정쩡하게 엮어 놓은 모양새다. 수능 정시 확대와 축소를 주장했던 여론 모두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올해 고 2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4년제 대학들의 수능 위주 전형은 19.9%다. 80%가 수시 전형이니 정시로 대학을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달 초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대안은 정시 비중 45% 이상 확대였다. 적어도 40%선까지는 정시 확대를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공론화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마음대로 생색내기만 하고 말았다”고 성토한다. 절대평가를 확대해 수능의 비중을 계속 줄일 것을 주장했던 쪽에서도 불만은 적지 않다. 점수로 줄을 세우는 평가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교육부는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들은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겼다. 정부의 공약인 전과목 고교학점제는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미뤘다. 사정이 이러니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이 모두 이번 입시안을 엉터리라고 비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입제도 개편안이 ‘돌고 돌아 제자리’로 결론난 데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무책임과 무능 탓이 무엇보다 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했어야 했던 개편안을 여론 눈치를 살피느라 ‘공론화 하청’ 논란만 거듭했다. 처음부터 교육부가 확고한 교육 비전을 갖고 일관된 논리로 정책을 입안하고 교육현장을 설득했더라면 지금 상황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계층과 단체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입시안을 시민 공론에 떠넘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한계였다.
1993년 현행 수능제도가 도입된 이후 입시 개편은 19차례나 이어졌다. 그때마다 몸살을 앓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몫이었다. 정권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교육정책의 한계는 이제 더 드러낼 바닥도 없다. 악순환을 멈추려면 점진적으로라도 대학에 자율권을 넘겨 주는 쪽으로 정부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에서도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대학들에 30% 이상 정시확대를 권고했다. 말이 좋아 권고이지 당장 돈줄이 막히는데 교육부의 권고를 무시할 대학은 거의 없다. 애매한 결정은 공론 뒤에 숨고, 정책 성과를 내려고 대학의 돈줄이나 죄는 이런 방식은 교육부가 뼈가 아프도록 반성할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입시 개편안은 이쪽 저쪽의 여론을 어정쩡하게 엮어 놓은 모양새다. 수능 정시 확대와 축소를 주장했던 여론 모두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올해 고 2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4년제 대학들의 수능 위주 전형은 19.9%다. 80%가 수시 전형이니 정시로 대학을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달 초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대안은 정시 비중 45% 이상 확대였다. 적어도 40%선까지는 정시 확대를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공론화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마음대로 생색내기만 하고 말았다”고 성토한다. 절대평가를 확대해 수능의 비중을 계속 줄일 것을 주장했던 쪽에서도 불만은 적지 않다. 점수로 줄을 세우는 평가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교육부는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들은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겼다. 정부의 공약인 전과목 고교학점제는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미뤘다. 사정이 이러니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이 모두 이번 입시안을 엉터리라고 비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입제도 개편안이 ‘돌고 돌아 제자리’로 결론난 데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무책임과 무능 탓이 무엇보다 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했어야 했던 개편안을 여론 눈치를 살피느라 ‘공론화 하청’ 논란만 거듭했다. 처음부터 교육부가 확고한 교육 비전을 갖고 일관된 논리로 정책을 입안하고 교육현장을 설득했더라면 지금 상황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계층과 단체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입시안을 시민 공론에 떠넘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한계였다.
1993년 현행 수능제도가 도입된 이후 입시 개편은 19차례나 이어졌다. 그때마다 몸살을 앓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몫이었다. 정권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교육정책의 한계는 이제 더 드러낼 바닥도 없다. 악순환을 멈추려면 점진적으로라도 대학에 자율권을 넘겨 주는 쪽으로 정부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에서도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대학들에 30% 이상 정시확대를 권고했다. 말이 좋아 권고이지 당장 돈줄이 막히는데 교육부의 권고를 무시할 대학은 거의 없다. 애매한 결정은 공론 뒤에 숨고, 정책 성과를 내려고 대학의 돈줄이나 죄는 이런 방식은 교육부가 뼈가 아프도록 반성할 문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