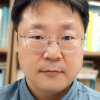귀화 앞둔 몽골 출신 고교생 벌드수흐
“친구들은 그냥 ‘벌드’라고 불러요. 제 이름 뜻은 ‘강한 도끼’인데 너무 센지도 모르죠.”

히시게 벌드수흐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나 할머니와 살았다. 부모 모두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다. 2009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자 문제로 초등학교 전학이 어려웠다. 큰 키 덕분에 체육특기생으로 경남 창원 사화초등학교에 들어가며 생전 처음 농구공을 만졌다. 고교 졸업반인 그는 슈팅가드와 스몰포워드를 모두 볼 수 있는데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픈 커리처럼 슈팅가드 자리를 더 좋아한다.
창원 팔룡중 시절 한 경기 최다 득점은 41점, 고교에 와서는 34점으로 기억한다. 이영준 마산고 감독은 슛을 쏠 때 더 자신감 있게 쏘라고 늘 주문한다. 벌드수흐는 “스킬트레이닝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 접했다. 힘들어도 재미 만점이다. 학교 훈련 외에 개인적으로 꾸준히 익히면 큰 도움을 받을 것 같다”고 어른스럽게 말했다.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는 그는 보완할 게 무엇이냐고 묻자 “웨이트트레이닝을 시작할 텐데 스피드를 높이고 드리블을 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슛 폼도 예쁘고 외모도 곱상해 몸싸움을 싫어하지 않느냐고 떠봤다. 금세 목소리를 높였다. “이길 땐 몰라도 질 땐 제 몸에 불이 나요.”
속초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7-02-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