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송 흐르던 80년대 거리, 아내 홀렸던 사이먼&가펑클
스물 몇 살 때다. 여자 친구가 불쑥 두 가지를 제안해 왔다. 혹시라도 자기와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먼 훗날 체코 프라하와 사이먼&가펑클 콘서트에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헐, 이과 출신인데 뜻밖에 낭만스러운 면도 있구나 하며 우선 놀랐다. 그렇게 어려운 조건도 아니고 또 결혼해야겠다고 내심 맘먹은 나는 즉각 그러겠다고 답했다.
사이먼&가펑클닷컴

지금은 우리의 케이팝이 아시아를 넘어 멀리 중남미의 청소년들까지 열광케 하고 있으나 30년 전인 1980년대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 가요의 폭이 그다지 넓지 못해 대다수 청춘들은 미국의 팝과 록, 프랑스 샹송, 이탈리아 칸초네 같은 서구의 대중음악에 심취하는 것으로 자신의 젊음을 증명했다. 사진은 미국 포크록의 상징인 사이먼&가펑클의 공연 모습. 1964년 결성돼 1970년 해체할 때까지 비록 짧은 기간 활동했지만 이들의 명곡이 지구촌 젊은이들에게 선사한 울림은 1980년대까지도 이어지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이먼&가펑클닷컴
사이먼&가펑클닷컴
그러나 문제는 약속 중의 하나인 사이먼&가펑클 콘서트였다. 어려운 것을 넘어 불가능에 가까웠다. 오래전에 결별한 두 분이 죽기 전에 회동해 콘서트를 열어야 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게다가 그 콘서트가 서울이나 도쿄에서라도 열려야 어떻게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 전설적인 듀오는 나의 맘도 몰라 주고 점점 할아버지가 되어 갈 뿐 콘서트를 열 낌새조차 없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뉴욕 센트럴파크 82년 실황공연 DVD를 구해 주며 달래 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먼 훗날 결혼을 하고 떠난 유학 중에는 짬을 내어 공연이 열렸던 센트럴파크와 캐나다 접경 메인주까지 다녀왔다. 바닷가재와 개기일식으로 유명한 메인은 스티븐 킹의 베스트셀러 소설 ‘돌로레스 클레이본’의 무대. 그러나 나의 목적은 메인주 초입의 시골 동네 스카버러를 찾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여행 책자에서 시 당국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 작은 동네가 사이먼&가펑클의 ‘스카버러 페어’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그러나 단지 스카버러에 가 봤다는 것만으로도 나와 아내는 그날 밤을 감동으로 설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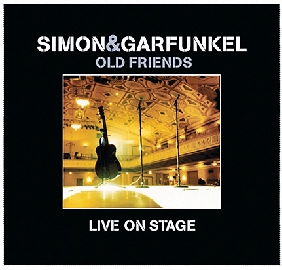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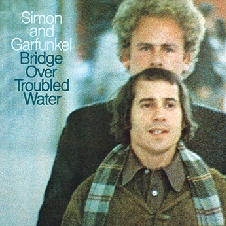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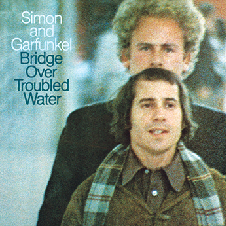
그리고 그 중심에 사이먼&가펑클이 있다. 이분들이 부른 노래는 70년대를 거쳐 80년대 이 땅을 풍미했다. ‘엘 콘도르 파사’,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사월이 오면’ 등등은 다방에서 빵집에서 심지어 영화가 상영되기 전 막간에 허구한 날 흘러나왔다. 거기다가 명문대 박사라는 후광까지 더해지면서 그 시절 젊음을 사로잡았다. 그러고 보니 까까머리 고1 때 교생 선생이 가르쳐 주던 “아름다운 스카버러여 / 나 언제나 돌아가리 / 내 사랑이 살고 있는 / 아름다운 나의 고향…”을 따라 부르던 생각이 난다. 35년 만에 최근 귀국한 박인희 선생이 그 옛날 부른 노래다.
사이먼&가펑클은 영화 ‘졸업’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왔다. 빨간색 스포츠카 쉐보레 카마로를 몰고 버클리대학에 다니는 여자 친구를 찾으러 가는 더스틴 호프먼이 지금도 또렷하게 생각난다. 우여곡절 끝에 여친의 결혼식장에 침입해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손을 잡고 냅다 뛴다.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도망치는 라스트 신은 지금도 자주 패러디되고 있는 명장면. 미국 중산층의 타락한 생활과 60년대 말 신세대의 심리적 불안을 그린 영화는 80년대 방황하던 이 땅의 청춘에게 먼 나라에 대한 동경을 꿈꾸게 했다.
영화는 무명의 연극배우 더스틴 호프먼에게 오스카상을 안겨 줬다. 또 배경음악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스카버러 페어’ 등이 알려지면서 사이먼&가펑클은 일약 세계 포크계의 지존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스카버러 페어’는 영국 민요에서 멜로디를 따왔다. 전쟁에서 죽은 병사가 자신의 몸에 피어난 풀들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다. 애절한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다.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의 저항 노래로 시작했지만, 지구촌 수많은 가수들에 의해 불리며 클래식 반열에 올랐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이 고운 노래만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도어스, 핑크 플로이드, 조 코커, 딥 퍼플, 리 오스카 등등은 물론이고 지미 페이지, 리치 블랙모어, 프레드릭 머큐리, 믹 재거, 핼러윈 등등은 고래고래 따라 부르며 고함쳤던 우리가 몹시도 사랑했던 아티스트였다. 신촌과 이태원의 데카당한 술집 벽면을 장식한 지미 페이지의 털북숭이 가슴과 중요 부위를 유난히 도드라지게 입었던 스키니진에 킥킥거리며 독한 술을 가슴에 들이부었다. 무엇 때문에 그리 분노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두들 분노를 가슴에 담고 살았다. 퇴폐적이고 불온한 팝은 불만투성이 그 시절 앵그리 영맨을 위로해 주었다.
클래식을 듣고 교양 있는 척하며 얘기하던 것도 그 시절 유행이었다. 덕분에 궁핍했던 청춘 시절 입주 과외를 하면서 푼푼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명품 오디오가 몇 세트 있고 오랜 세월 어렵게 사 모은 적잖은 분량의 그래머폰, 데카 원판은 지금도 장롱 깊숙이 잠자고 있다. 바하의 파르티타는 내가 즐겨 듣는 레퍼토리이고 빈한했던 시절 아르바이트한 돈을 꼬불쳐 뒀다가 가끔은 폼나게 콘서트홀을 찾기도 했다. 1988년 가을 서울올림픽 기념으로 삼성그룹에서 초대한 루치아노 파바로티 공연 팸플릿 서문도 내가 썼다. 주최 측에서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내게 부탁해 왔고 그날의 팸플릿은 지금도 서재 한 구석에 잠자고 있다.
세월이 흘렀다. 얼마 전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신세대 가수 SG 워너비가 사이먼&가펑클을 닮고 싶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다. 노래가 발표될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들이 전설적인 듀오를 닮고 싶다는 당찬 고백에 못내 그리운 80년대를 잠깐 생각해 봤다. 그러면서 나의 아내가 SG 워너비 공연에 모셔가면 그 옛날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사월이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어야 하는 잔인하고도 기막힌 계절이 왔다.
서강대 MOT 대학원 교수(매체경영) yule21@empal.com
●알림 토요일자에 격주로 연재되던 ‘김동률 교수의 1980´s 청춘의 재발견’이 4월부터 금요일자로 옮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6-04-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