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폭의 수묵화같은 제주시 해안동 산 220-13에 위치한 어승생악 오름 정상에서 바라본 한라산 능선에 이쓴ㄴ 작은두레왓, 민대가리오름, 사제비동산 등이 구름에 보일 듯 말 듯 아른거린다. 제주 강동삼 기자


어승생악오름 동쪽 아흔아홉골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어승생악오름 정상에서 눈발이 거세지다가 잠시 푸른 하늘을 선물하며 산자락과 오름을 드러내 감탄사를 연발하게 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너에게 가는 길은 그런 궁서체처럼 예스럽고 까칠하지만 솔직담백한 오베같은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다. 너에게 다가갈수록 세상에는 흑과 백만 있는 듯,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듯, 순백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사람 발길이 드문 그늘진 모퉁이에만 잔설이 남아있을 정도로 녹아내린 도심과 달리, 제설차가 내 키보다 더 큰 언덕을 이룰 만큼의 폭설을 치워 통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 오베라는 남자처럼 까칠하지만 너무 솔직한, 너무 고전적인 산


어승생악 오름으로 가는 입구에는 설국이다. 새들도, 노루도 설국에선 배경에서 삭제돼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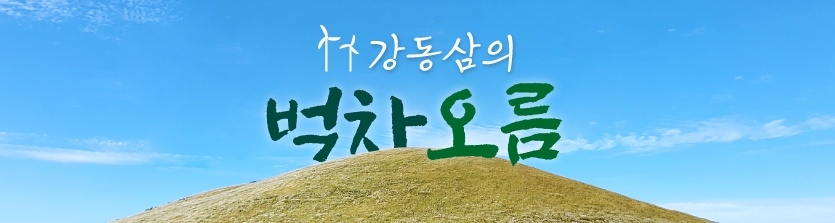
<22> 궁서체를 닮은 설경 ‘어승생악오름’
준비성이 뛰어날 것 같지만 즉흥적이어서 실상은 허당. 어리목으로 왔다가 표지판에 아이젠을 하지 않으면 탐방을 금지한다는 현수막 때문에 관음사 등산장비 파는 곳으로 가서 아이젠을 구입하고 돌아오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한 뒤였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내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걷는다. 올라갈수록 아이젠을 하지 않았다면 내려오는 길이 낭패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눈이 무릎까지 찬 어승생악오름을 오르기 시작했다. 나무계단이 많은데 폭설로 인해 계단이 안보일 정도다. 폭설이 오르막 계단을 오를 때 겪는 고통을 줄여줄 정도였다. 하얀 눈은 마치 하얀 솜이불을 밟는 듯, 혹은 하얀 소금사막을 걷는 듯 했다.
얼마전 D일보 임모 선배가 자문해주고 직접 사진까지 찍었다는 ‘어승생 오름, 자연을 걷다’(글 김은미 송관필 안웅산 조미영)신간에 나온 것 처럼, 어승생악오름을 오르다 보면 수많은 식생과 만난다. 고사리류 양치류부터 조릿대, 졸참나무, 서어나무, 비목나무, 한라산 구상나무 등과 조우한다. 특히 크리스마스트리용으로 쓰이는 구상나무는 지천에 깔려 있다.
#이스렁거리기도 하고 어슬렁오르기도… 임금이 타는 말 ‘어승마’ 키우던 곳


어승생악 정상으로 가는 길에 만난 탐방객이 나무와 바위가 하나가 된 나무를 지나치고 있다. 정상에서 만난 LG통신망(가운데). 어승생악오름 정상 표지석. 제주 강동삼 기자
그리고 비교적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승생오름의 이름이 어승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정설처럼 내려온다. 어승마란 임금이 타는 말이라는 뜻인데 어승생오름 주변에서 키운 말이 어승마가 되었기 때문에 어승마를 키운 곳이라는 뜻의 어승생오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1653년 제주목사 이원진이 쓴 ‘탐라지’에 ‘어승생오름은 제주 남쪽 25리의 거리에 있다. 그 산꼭대기에 못이 있는데 둘레가 100보가 된다. 예로부터 전하기를, 이 오름 아래에서 임금이 타는 말이 났다고 하므로 그렇게 불린다’고 기록되기도 했다.
아무튼 한라산 북서쪽 당당한 위용을 뽐내며 우뚝 선 독립봉 어승생악오름은 해발고도는 1169m다. 노형동, 연동, 오라동의 3개동에 발을 뻗고 있다. 어승생악오름 인근에 위치한 어리목탐방안내소가 해발 970m에 위치해 있어 실상은 약 200m만 오르면 정상에 도달하는 오름이다.
평상시에는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도 오를 수 있는 오름이지만, 이날 눈 덮인 오름을 아이젠도 차지 않은, 운동화만 신은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들의 용감함에 놀랐다. 위험천만, 너무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오베처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신경쓰였나보다. 보다 못한 나머지 결국 “어머니 정말, 아이젠 없이 오르다가 큰일 나요. 내려올 때 미끄러워 내려올 수 없을 거예요”라고 조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고날까봐 평소하지도 않던 오지랖을 떠는 오베가 됐다. 정말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 중에도 아이젠을 차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기도 했다. 생각이란 것을 비우자. 당사자들인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잖은가. 오지랖이여 안녕~~.


붓글씨체에 어울리는 고전적인 글씨체 궁서체를 닮은 듯한 어승생악은 실제 눈내리는 겨울에 오르면 화선지 속에 그려진 한폭의 수묵화를 연상시킨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4 버킷리스트는 최고의 해독제 ‘미소를 짓고 살자’새해를 앞두고 어승생악을 오르면서 잭 니콜슨(에드워드역)과 모건 프리먼(카터 역)의 케미가 빛나는 영화 ‘버킷리스트(로브라이너 감독.2008년作)’처럼 하고싶은 소망을 실행에 옮기듯, 2024년의 버킷 리스트를 작성해 실천해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다. 그 중에 제1실천은 바로 ‘미소를 짓고 살자’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란 책에는 ‘미소는 한푼도 들지 않고 많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나온다. ‘미소는 받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고 미소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는 안식, 실망한 사람에게는 빛, 슬픈 사람들에게는 햇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해독제’란다. 하지만 ‘미소는 돈 주고 살 수도, 구걸할 수도, 빌릴 수도, 훔칠 수도’ 없단다.
물론 ‘버킷리스트’ 영화에 나온 항목처럼 배꼽 빠지게 눈물날 때까지 웃어보기, 카터의 소원처럼 히말라야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겨울철 눈이 올 때 한라산 정상을 다시 밟아보고 싶기도 하다.
30여분쯤 올랐을까. 정상에 다다를때 쯤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어승생은 화구호를 가진 오름의 하나다. 둘레 약 150m의 야트막한 화구 바닥에 물이 괴는 부분은 둘레가 80m 안팎으로 정상에서 한라산쪽으로 서면 어리목광장 주차장이 한눈에 들어오고, 1339m 높이의 금봉(작은두레왓)이 우뚝 서 있다. 물론 이날은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눈발이 날려 그 절경을 산 허리 밑으로만 빼꼼히 보여줄 뿐이었다. 야속한 날씨.


어승생악오름 등산로길에는 무릎까지 푹푹 들어가는 눈이 쌓여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버킷리스트 추가… 죽지 않으려면 죽을만큼 버티기, 힘들어도 버티기그러나 정상에 선 지 10여분 지났을까. 아주 잠깐 하늘이 한라산쪽만 맑아지더니 웅장하고 장엄한 병풍같은 한라산 자락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햇빛 속, 구름 너머로 한폭의 그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 감춰 버린 풍경. 마치 한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 화선지에 설경이 스며든듯 했다. 세로 글씨에 어울리는 궁서체로 그 화선지 위에 시조를 읊어대더니 ‘그레이’하게 흐릿해진다. 그렇게 산세가 아름답고 아찔한 절경은 전설로 남으리라. 이후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겨울의 잔설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 바람은 시조의 운율을 흉내내는 듯 잔기침을 헛헛하게 해댔다. 그리고 금세 하얀 수염이 자란 듯, 눈발이 쌓이고 한라산 머리는 안개구름에 가려 신령스런 분위기를 자아냈다.
북쪽으로는 제주시내가 내려다 보이고 도두봉, 민오름, 남짓은오름, 별도봉, 원당봉까지 펼쳐지는 곳이었다. 5분여 아주 짧게, 잠시 푸른 하늘을 선물하던 신은 심술궂게도 다시 회색빛 하늘로 변하더니 하얀눈이 심술궂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어승생악정상(해발 1169m)이라고 쓰인 표지석 앞을 아쉽지만 등져야 했다. 눈길을 내려가는 완벽한 길은 아무도 밟지 않는 눈 위를 밟고 가는 길은 아닐까. 잘 올라왔으니까 잘 내려가는 법도 이미 알았으리라.
이 하얀 숲에선 길잃은 사슴에게는 집과도 같은 곳일지 모를 일이다. 하산하는 길. 로버트 드 니로 주연의 ‘디어헌터(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1979년작)’에 나오는 사슴과 함께 흘러나오는 주제곡 ‘Cavatina(스탠리 마이어스 작곡)’를 흥얼거렸다.
궁서체 같은 남자, ‘오베라는 남자’처럼 우뚝 선 어승생악 오름을 내려오면서 오베의 아내 소냐가 한 말이 별안간 머릿 속을 스쳐갔다. “죽지 않으려면 죽을만큼 버텨야 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면 대지 위에 새싹이 돋아나듯, 우린 곧 봄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까지 ‘죽을만큼 힘들어도 버티기’를 새해 또다른 버킷리스트 항목에 추가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