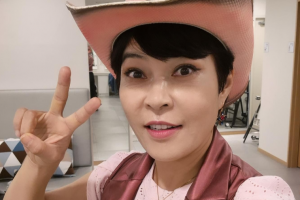포스트 박태준 이후 개혁… 지배구조는
2000년은 포스코가 민영화라는 커다란 변화를 맞은 시기다.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단순히 손바뀜을 한 것을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때이기도 하다. 민영화 이후 포스코는 전문 경영진의 전횡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작업에 매달렸다. 민영화 완료 1년 전인 1999년 3월, 전문경영진의 책임경영과 이사회의 경영감시 및 견제기능을 강화한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해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경영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경영기반을 구축했다. 소유와 경영은 완전히 분리됐다. 전문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하지만 중요한 의사 결정은 독립적인 이사회를 거치게 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외환 위기 당시인 1997년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도입한 사외이사제는 상장 기업 중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포스코 이사회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7인과 사내이사 5인으로 구성된다. 7명의 사외이사 중 1명이 반드시 이사회 의장 및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사외이사 중심의 운영 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2006년에는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과 경영진을 대표하는 최고경영자(CEO)를 분리해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진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정기적으로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운영해 각 의제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독립적인 의견을 수렴할 기회도 보장한다.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는 모두 6개에 달한다. 철강 투자의 검토와 심의를 담당하는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5개 전문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에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해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한다. 해외 유력 투자가들이 포스코 지분을 늘리며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는 이유도 이와 같은 투명한 지배구조가 배경이 되고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5-03-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