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지미오름(지미봉) 정상에서 바라본 성산일출봉과 우도섬이 한눈에 보인다. 제주 강동삼 기자
‘보드랍고 대지 같고 자그마하고 동그랗고 투명하고/당신은 초승달이요 사과나무 길입니다./벌거벗은 당신은 밀 이삭처럼 가냘픕니다/벌거벗은 당신은 쿠바의 저녁처럼 푸릅니다/당신 머릿곁에는 메꽃과 별이 빛납니다/벌거벗은 당신은 거대하고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라는 편지를 쓴 ‘우편배달부’를 흉내낼 순 없지만, 정말 종달리의 잔잔한 바다에 편지를 띄우고 싶은 날이다.


지미봉 정상에서 바라본 종달리 밭과 성산일출봉 일대의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제주 강동삼 기자
# 올레길 마지막 21코스… 호락호락하게 보았다가는 가파른 계단에 혼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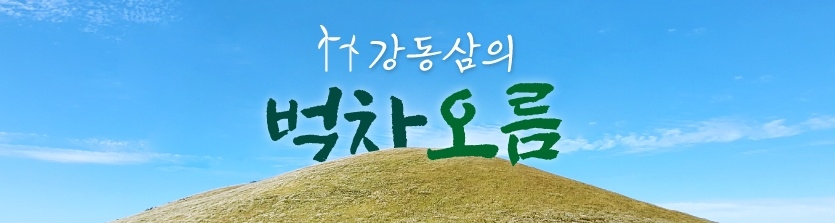
<17>우도와 가장 가까운 오름 지미봉
안녕? 넌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정류장에서 광치기 해변까지 이어지는 제주 올레 1코스(15.1㎞)와 해녀박물관~구좌읍 종달바당까지 이어지는 11.3㎞의 마지막 코스인 21코스 근처에 있더라.
‘우리가 처음이라고 부르는 것, 사실은 그것이 종종 끝인 경우가 많다. 끝이란 사실 출발하는 지점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 사월은 잔인한 달이라던 ‘황무지 ’시로 유명한 T.S.엘리엇(1888. 9. 26 ~ 1965. 1. 4) 시인이 그랬던 것 같아. 아마도 시작은 끝이고, 끝은 곧 시작을 의미하는 듯 해. 마을 이름도 시작을 일으키는 시흥리(始興里)와 끝에 다다르는 종달리(終達里)잖아. 조선시대 제주목사가 부임하면 섬을 한바퀴 돌며 시찰하는 순력 행사를 치렀을 때도 시흥리에서 시작해 종달리에서 끝났다고 하던데 아마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애.
제주의 땅끝 종달리 산 3-1에 제주의 꼬리 지미봉인 네가 거기에 서 있더라. 넌 해발고도는 166m에 불과할 정도여서 과하게 크진 않았어. 비고가 160m되는 가파른 경사진, 북향으로 말굽진 분화구가 있는 오름이더구나. 낮은 산처럼 보이지만 성산포 길목에서 눈에 띄더라.
어쩌면 미리 사전 정보를 얻지 않고 성산포에 갔다가 우연히 들렀다면 입구에서 시작되는 가파른 계단에 혀를 내둘러야할 지도 몰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단 때문에 동행한 아내와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 괜히 눈치가 보였거든. 말을 시켰다가는 “왜 하필 이런델 아침부터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냐”는 핀잔을 들을 게 뻔했지. 모처럼 같이 산책하거든. 다행인 건 중간 중간 나무벤치 덕분에 쉴 수 있었다는거야. 또한 앞에 펼쳐지는 전경에 짜증났던 몸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
내려오던 탐방객은 “아직 더 계단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헉헉대면 어쩌려고” 하며 독백처럼 혀를 내둘렀어. 그걸 듣자니 대체 얼마나 더 가야하는지 위를 쳐다봤지. 그러나 파란 가을하늘이 보이더라. 가파른 만큼 정상은 금세 도달했어.
지미봉 정상 벤치에 앉으면 가슴이 뻥 뚫렸어. 그리고 놀라운 선물도 받았지. 바다 건너 우도가 보이고 성산 일출봉이 한눈에 들어와 힘든 경사를 올라온 보람을 느꼈지. 시야가 막힘이 없어 제주 오름 368개 가운데 전망은 둘째 가라면 서럽단다.
지미봉(地尾峰)의 표기를 중시해 제주목의 땅 끝에 있는 봉우리라는 뜻으로 해석하더라. 이 오름 정상에는 조선시대때 정의현 소속의 지미망(指尾望)이라는 봉수대가 있었대. 말굽형 굼부리가 북쪽으로 벌어져 있으며 돌담으로 둘러진 밭들이 그림처럼 펼쳐지는게 보여.
실제 오름 꼭대기에 봉수대의 흔적이 비교적 뚜렷이 남아 있는데 북서로 왕가(往哥)봉수, 남동으로 성산(城山)봉수와 교신하였다더라. 예전에 한경면 두모리를 섬의 머리 또는 제주 목의 머리라 하고, 동쪽 끝의 이 오름을 ‘땅끝’이라 했다고 해. 우도, 성산일출봉, 식산봉, 두산봉까지 시원하게 내다보였어.


지미봉에서 바라본 구름 속 한라산과 오름들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지미오름 표지석, 21코스 올레 간세표시. 지미오름 정상의 삼각점. 제주 강동삼 기자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처럼… 사람은 배반할 지언정 풍경은 배반하는 법이 없다한때 종달리 사람들을 ‘소금바치’라 부를 만큼 종달리 소금밭은 제주 제염의 효시. 도내 최대 소금생산지였으며, 소금의 질이 좋아 임금님에게 진상되기도 했더구나. ‘한국수산지’ 제3집(1910)에 따르면 ‘1573년 강려(姜侶) 목사가 이곳 해안 모래판을 염전 적지로 지목하고 마을 유지를 파견해 제염술을 전수해다 새로운 형태의 소금밭을 일구었다’고 나온단다.
해방 이후 염전으로 이용되던 간석지(干潟地)는 교통이 발달되어 육지부의 소금이 들여오면서 1957년부터 근 12년 동안 대대적인 간척사업을 벌여 논을 만들었대. 그러나 논농사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논은 차츰 습지로 변해 현재는 갈대가 무성하여 철새도래지로 변하게 됐어.
내려오는 길에 곳곳에 연못같은 물이 고여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또한 종달포구에서 성산쪽으로 해안가를 드라이브 하다보면 곳곳에 바닷물이 들어와 파래들로 덮인 해안을 만났는데 그런 염전의 흔적이 남아 있는게 아닐까 싶어.
너는 다리 너머 하도리와도 가깝더구나. 그 철새도래지가 있는 마을말이야. 제주로 날아드는 새들은 하도리에 내려앉는 것일까. 철새도래지(둘레 약 3700m, 면적 36만 9000㎡)로서 겨울이 되면 겨울철새인 저어새, 도요새, 청둥오리 등 수만마리가 날아와 겨울을 난다더구나.
‘아름다운 풍경으로 마음의 위안을 찾게 된다. 풍경이란 거의 배반하는 법이 없다’.
무심코 로맹 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단편 소설의 한 문장이 하도리와 오버랩됐어.
P.S.
시흥리를 빠져 나오기 직전 ‘성산 봄죽칼국수’집에서 얼큰새우칼국수와 보말칼국수로 허기진 배를 달래면 그만이더라. 양만 놓고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맞는 식당인 듯 싶기도 해.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드라마 ‘런온’ 촬영지라고 붙어있기도 하더라.


성산읍 고성리 몰입형 예술전시관 ‘빛의 벙커’에서 현대미술의 아버지 폴 세잔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잠깐, 여기 쉬었다 갈래… ‘빛의 벙커’에서 폴 세잔을 만나다성산읍 고성리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가다보면 왼쪽 시골길을 따라 가다보면 국내 최초 몰입형 예술전시관 ‘빛의 벙커’(고성리 2039-22·오전 10시 오픈)가 나온다.
‘빛의 벙커’는 옛 국가기간 통신시설이었던 숨겨진 벙커를 빛과 소리로 새롭게 탄생시킨 문화 재생 공간으로, 현재 제주를 대표하는 예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외부의 빛과 소음이 완벽히 차단된 이 공간에는 곳곳에 고화질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면, 기둥, 바닥 등 사방에 명화가 투사되어 역동적이고 완벽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그동안 클림트, 반 고흐, 지중해의 화가들을 주제로 한 전시에 이어 네번째 전시 ‘세잔, 프로방스의 빛(Cezanne, The Lights of Provence)’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추석연휴기간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전시를 내년 3월 3일까지 연장했다.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폴 세잔과 더불어 “세잔은 추상미술의 토대를 쌓아올린 예술가”라고 했던 추상회화의 선구자 바실리 칸딘스키의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다. 공간을 가득 채운 고화질 영상과 클래식, 재즈,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선사하는 역동적인 몰입감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폴 세잔의 초기 습작부터 후기 작품까지 총 7개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분 동안 지속된다.
피카소는 “세잔은 나의 유일한 스승이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와 같다”라고 했을 정도다. 그러나 폴 세잔은 은행원의 아버지(루이 오귀스트)가 유산을 남기고 죽을 때까지 가난에 찌들어 살았다. 아마도 법대를 마치고 변호사가 되길 바랐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화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세잔의 삶에선 프랑스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에밀 졸라를 빼놓을 수 없다. 세잔은 학창시절 말더듬이 졸라의 편에 서면서 우정이 싹텄다. 그때 졸라가 고마움을 표하며 사과가 든 광주리를 세잔에게 선물하며 ‘세잔의 사과’라고 말했단다. 세잔이 반복해서 그리던 탐스런 사과는 아주 먼곳(어린시절)에서 왔다고 고백했다.


성산읍 빛의 벙커 네번째 전시 폴 세잔의 ‘프로방스의 빛’은 내년 3월 3일까지 연장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그의 자화상도 만날 수 있다. 세잔은 자화상을 46점이나 남겼을 정도로 많이 그렸지만 단 한점도 사인이 없다. 그는 “내가 작업할 때 누군가 쳐다보는 것 만큼 고통받은 적이 없다. 누가 있는 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빛의 벙커 옆 커피박물관 소나무 숲속에서 커피 한잔의 여유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