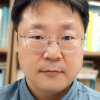관리자들/이혁진 지음/민음사/196쪽/1만 4000원

민음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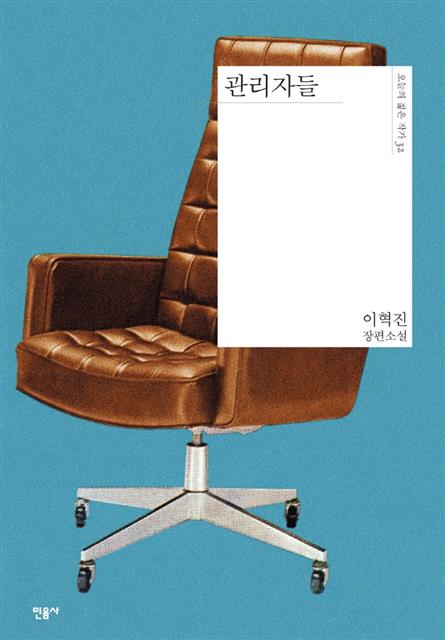
‘관리자들’ 책표지.
민음사 제공
민음사 제공
다니던 직장을 잃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된 선길에게 현장소장은 멧돼지로부터 현장을 지키는 일을 시킨다. 선길은 소아암을 겪는 아들을 지키고자 갖은 수모를 참아냈다. 특유의 성실함으로 현장에서 동료들의 신임을 얻었지만 선길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소장의 뜻대로 현장 인력들이 입을 맞춘 결과 선길은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술까지 마시다 사고를 당한 구제불능으로 매도된다. 굴착기 기사 현경이 진실을 밝히려 고군분투하지만, 부실한 안전관리가 드러나면 일터를 잃을 것이 두려운 인부들은 “선길은 어쨌든 죽었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논리로 무마하려 한다.
작가는 원칙과 질서보다 자신의 이해관계만 중시하는 관리자들과 상황 논리 앞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타협하는 소시민들의 담합이 가져온 비극을 펼쳐 냈다. ‘관리’라는 이름의 부조리는 소장이 인부 식당 부식비를 빼돌리려고 있지도 않은 멧돼지 피해를 가공하는 데서 시작한다. “책임은 지는 게 아니야. 지우는 거지. 세상에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없거든.”(46쪽) 소장의 말은 보신에만 연연하는 지도층 인사들의 병폐를 꼬집는다.
조직 내부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보여 주지만 결국 실체를 드러낸 건 끄떡도 하지 않은 거대 조직이다. 약자들이 희생된 자리에는 아무 상처도 입지 않는 관리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진실을 밝히려는 소수의 존재는 인간에 대한 한 줄기 희망을 전하는 듯하다. 작가는 “현실을 고발하기보다 우리가 받는 압박이나 유혹의 핵심이 무엇인지 독자들이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책을 덮고 나면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에 대해 다시금 곱씹게 된다.
2021-09-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