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시몬 비젠탈 지음/박중서 옮김/뜨인돌/472쪽/1만 9800원

서울신문 DB

폴란드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의 여성 수감자들. 1940~1945년 이 수용소에서는 유럽계 유대인 약 110만명이 살해됐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말살정책’을 총지휘한 아돌프 아이히만.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범죄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나치 장교 앞에서 침묵한 채 병실을 나섰던 비젠탈은 이후 번뇌에 빠졌다. ‘용서했어야 할까’, ‘나의 용서가 모든 유대인들을 대신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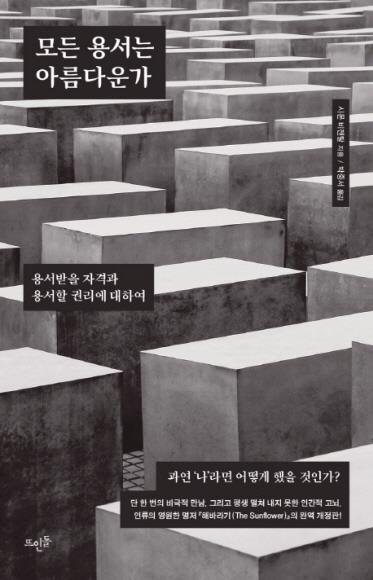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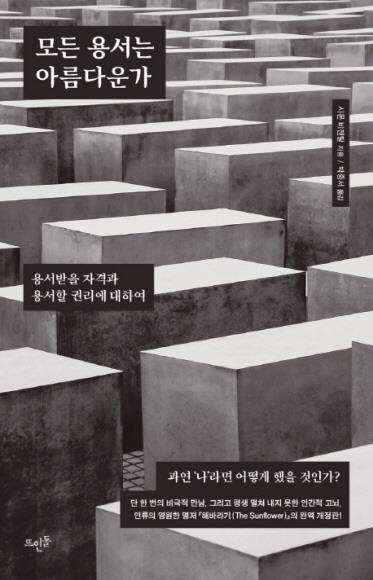
53인의 글은 가치관과 입장에 따라 다양하다. ‘섣부른 용서는 희생자에 대한 배신’,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라면 하느님조차 피고인일 뿐’, ‘그의 인간성에 경의를 표한다’…. 이탈리아 화학자 프리모 레비는 ‘만약 그를 용서했다면 더 큰 고통에 직면했을 것’이라 단언하고 미국 철학자 허버트 마르쿠제는 ‘섣부른 용서는 악을 희석시킬 뿐’이라고 거든다. 미국의 유대교 신학자 앨런 버거는 ‘값싼 은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런가 하면 달라이 라마는 ‘기억하되 용서하라’고 일갈하며 데스몬 투투 주교는 ‘용서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독자들은 이 화두를 놓고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를 놓고 많은 상념에 빠져들 듯하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일본군 위안부처럼, 엄연하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사죄 없는 역사의 아픔에 포개져 더 혼란스럽다. 그럼에도 용서와 화해의 방향은 또렷하게 다가온다.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유대역사기록센터’를 설립해 나치 전범을 추적했던 비젠탈은 1996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 옛 유고슬라비아의 테러 주동자들을 단죄하도록 촉구했다. “보스니아 사태는 그야말로 반인류적인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종 청소며 남녀노소를 불문한 민간인 학살이며 무슬림 여성에 대한 강간 등 비록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당시의 공포를 상당 부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소에서 나치 장교를 용서하지 못한 일을 두고 번뇌에 빠진 비젠탈에게 유대인 친구가 던졌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그렇게 끙끙 앓는 소리를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일단 우리가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이 세상이 모두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사람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게 된 다음이라면 그 용서니 뭐니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할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야.”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9-11-08 3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