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언어학자의 문맹 체류기/백승주 지음/은행나무/252쪽/1만 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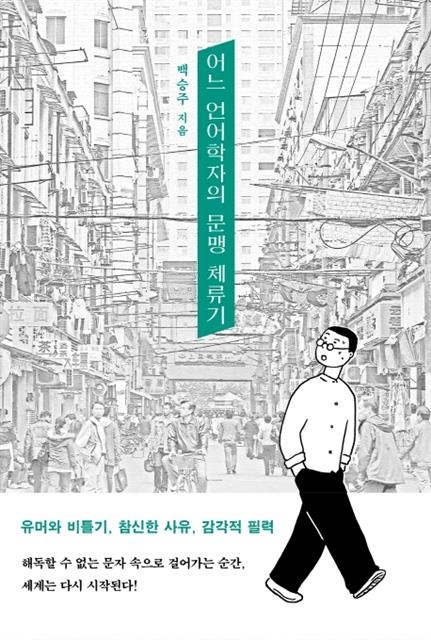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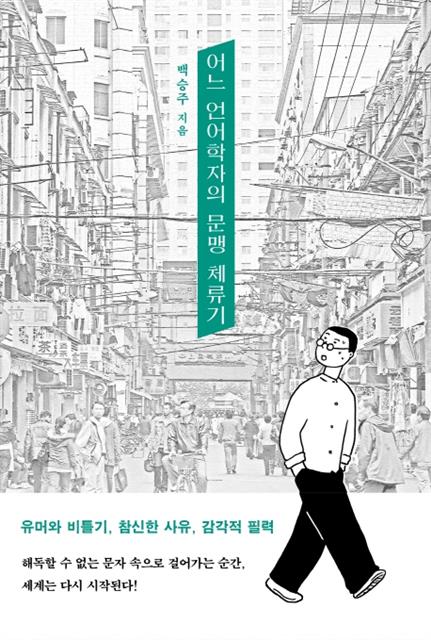
중국 상하이 푸단대에 1년 동안 교환교수로 가게 된 저자는 이런 다짐을 했다. 발상의 시작은 한 가지 궁금증이었다. 지난 10여년간 그가 가르쳤던 외국 학생들, 연고 없는 한국 땅을 용감하게 찾아와 낯선 언어를 배운 그들의 심정이 궁금했다. 그래서 같은 처지가 돼 보기로 한다.
백승수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그렇게 2017년을 보내면서 겪은 일화를 모아 ‘어느 언어학자의 문맹 체류기’에 담았다.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겪는 일은 예상 그대로다. 예컨대 저자는 중국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기 위해 방안에서 “워 야오 이베이 빙더 메이스카페이”(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는 말을 50번도 넘게 되뇐다. 그런데 웬걸, 당당하게 주문을 했지만, 점원이 예상에 없던 질문을 던지자 당황스럽기만 하다. 결국 점원이 계산대 옆 컵을 가리켰다. ‘아. 컵 사이즈!’ 저자 역시 손가락으로 ‘그란데’ 사이즈 컵을 찍은 후에야 주문이 끝났다. 그리고 나서 든 생각. ‘가리키기란 초능력이 아닐까?’
식당에서는 한국과 달리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차가 나오고, 마트에서는 한국과 달리 봉지를 손님에게 주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사회의 ‘디폴트’(기본설정)란 무엇인가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는 ‘왜 내 디폴트는 이 모양일까?’ 한탄하기도 한다.
사기꾼들에게 끌려가 술값 폭탄을 맞은 일, 인터넷부터 수도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이 주야장천 고장 나지만 주인집이 오면 멀쩡해지는 숙소에서 겪은 일 등 16편의 에피소드를 재치 있게, 그리고 인문학적 성찰로 풀어낸다. 언어를 잃은 채 생활해 본 저자는 결국 사회가 언어를 매개로 얽히고설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술술 읽히고 재미도 있지만, 중반 이후부터 언어와 관련한 고찰 대신 외국인의 처지에서 본 중국 이야기가 많아진다. 언어 쪽을 좀더 풍성하게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8-16 3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