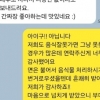‘난해시’ 쓰던 김언 시인 첫 시론집 ‘시는 이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2000년대 중후반,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시를 쓰는 ‘미래파’로 분류돼 아예 ‘소설을 쓰자’(민음사·2009)는 제목의 시집을 냈던 시인, 김언(46)이 등단 20년을 넘어 시론집을 냈다. ‘시는 이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난다)이다. 1998년 등단해 6권의 시집을 냈던 시인이 2005년에서 2016년 사이 문학지 등에 기고한 시에 대한 단상을 묶었다. 어느덧 중견인 시인의 시론집은 쉬우면서 어렵다. 외국 학자들의 어려운 이론은 없지만, 책 자체로 한 덩어리의 시이기 때문이다. 문장 사이사이 그 행간을 파악하려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도 읽어야 한다. 대학 세 곳과 사설 아카데미 등에서 시 창작 강의를 하고, 그 틈에 시를 쓰고 시론을 쓰고 시 관련 문학상 심사를 보는 시인. 시가 곧 삶이어서 시론집마저도 시로 승화시킨 시인을 9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김언 시인은 학사 전공이 두 개다. 부산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편입해 다시 졸업했다. 그럼 시 쓰는 공학도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문학 하는 기질로 봤을 때, 공대 공부를 같이 껴안고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황지우의 시에 반해 시를 쓰게 됐다는 시인의 삶은 그렇게 곧 시가 됐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시론집을 낸다는 게 사실 부담은 된다. 시집을 한두 권 내서는 나오기가 쉽지 않고, 서너 권 이상은 누적이 돼야 한다. 자기 시를 포함해서 타인의 시까지 시 일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용량’이 좀 돼야 한다고 해야 하나. (시론집을) 쓰는 것도 힘들지만 내는 것도 힘들었다. 출판사에서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책이니까. 시집이 많이 나가는 시절이라야 시론집이 보이지 않게 자양분이 되는 것일 텐데…. 사실 출판사에서도 큰맘 먹고 내는 거다(웃음).”
-책 제목이 ‘시는 이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이다. 시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 그 자체’라는 게 책의 논리인데,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연기’라는 이미지에 꽂혀 있다. 사는 게 덧없어서(웃음). 처음에는 1차원적으로 연기에 대해서 쓴다. 그게 누적이 되면 내가 대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연기’처럼 된다. 빌딩을 봐도 연기 같은 흐물흐물한 이미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보이게 되고, 더 나아가면 문체도 ‘연기’에 가까워진다. 대상에 많은 공력을 들이게 되면 ‘그것 자체’가 되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는다. 내가 아무리 ‘연기에 꽂힌다’고 해서 연기인 것은 아니듯이. 상징적인 좌표로서의 허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좌표를 향해 나아가다 떨어진 ‘실패한 부산물’들이 그 사람의 작품이 된다.”
-시인에게 시론이란 어떤 의미인가. 시로는 못다 한 이야기를 푸는, 갑갑증을 해소하는 창구인가.
“제일 소박하게는 자기 시의 방향을 잡아가는 논리다. 이런저런 평가에 흔들릴 때 암암리에 좌표를 잡아주는 거다. 지금까지 써 온 것을 시가 아닌 다른 언어로 풀어서 해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역사’도 된다. 또 타인의 시도 함께 보면서 한국 시, 시 일반에 대한 고민이 되기도 한다. ”
-시를 쓰고, 시론을 쓰고, 시 창작 강의도 하고 있다. 시인에게 시란 무엇인가.
“‘시=나’다. 시는 자기 기질에 가장 충실해야 하고, 가장 나다운 글쓰기를 찾아가는 방식이 ‘시 쓰기’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자기 기질을 키워주는 쪽으로 많이 주문하는데 의외로 힘이 든다. 좀 서투르고 거칠어도 자기 발성으로 나오면 되는데 한두 줄 써내려 가다가 ‘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다가 자기 목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노래방에서 음정, 박자 맞추다 정작 중요한 자기 목소리를 잃는 것과 같다.”
-시인은 줄곧 ‘난해한 시를 쓰는’ 미래파로 분류됐다. 책에서도 ‘난해시’라는 딱지에 대한 거부감이 묻어나더라.
“그 세대의 시인들이야말로 대체로 ‘자기 기질에 충실해야 한다’, ‘시에서도 시 밖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당시는 전통 서정시, 생태시 담론이 힘이 셀 때인데, 뭐든 강하면 갑갑해지기 마련이다. 그 반대 논리로 자연스럽게 나온 게 미래파가 공유했던 정신이다. (미래파는) 이기적으로 시를 썼지만 정작 (시 속에) 사회를 염두에 둔 발언은 많지가 않았다. 결국 2010년대로 접어들며 시와 정치 담론을 연결시켜 고민하는 사유들이 많이 나왔다. 미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정치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고, 배운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지껄이다 보니 역설적으로 뚫리게 된 거다. 우리는 일종의 ‘낀 세대’이기도 하고, (나는) 거기서 꽁지발이다(웃음).”
‘난해시’라는, 시인 표현으론 ‘접근 불가’ 판정을 받았던 시인. 20여년이 흘러 이제는 그도 “골치 아픈 시는 안 읽고 안 쓰게 됐다”. 대신 시인은 “강속구 투수가 젊은 시절에 ‘파이어볼’을 던지다 나이가 들어 투구폼이 간결해지며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 것처럼 지금껏 쌓아온 경험에 기대서 시를 쓰겠다”고 했다. 시에서의 소통은 ‘애인 만들기’이며, 세상에는 애인보다 애인 아닌 사람이 더 많다던 시인. 애인은 한 명으로 족하듯, 단 한 명의 독자만 있어도 가던 길을 계속 가겠다는 다짐으로 보였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9-04-1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