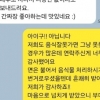[뉴스 전에 책이 있었다]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는 마약의 역사를 더듬어, 그것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책이다. 마약은 한국 사회의 여러 금기 가운데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책은 마약이 무엇이며, 왜 금지되고 어떻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지를 밝히면서도, 마약을 ‘좋다’ 혹은 ‘나쁘다’의 개념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마약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됐고, 일정 부분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속식물학자 테런스 매케나는 고대 인류가 버섯에서 채취한 ‘실로시빈’이라는 환각물질을 ‘빨고서’ 급속도로 진화했다는, 일명 ‘마약 원숭이’(stuned ape)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네안데르탈인 유적에서는 실제로 마약성 식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인류 조상들이 마약과 불가분의 관계였다는 것은 명확한 셈이다. 이를 ‘마약’이라는 이름으로 금기한 것은 서구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이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 것은 남용과 중독에 따른 사고가 넘쳐나기 시작한 19세기 들어서다.
저자는 마약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권한다. 마약 사용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일은 그들을 음지로 숨게 만들며, 결국에는 범죄 조직의 배만 불린다. 세간의 인식을 뛰어넘는 정책을 편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마약중독에 의한 사망보다 주사기를 돌려쓰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인지하고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마약의 불량 여부를 출장 감별해 주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마약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미국과 영국보다 마약으로 인한 손실이 줄어들었다. 유럽 몇 나라들이 네덜란드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추세다. “효율을 위해 도덕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네덜란드의 마약 정책은 효율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정리한다.


장동석 출판평론가·뉴필로소퍼 편집장
장동석 출판평론가·뉴필로소퍼 편집장
2019-03-22 3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