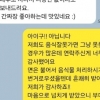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들의 위인전을 읽으면 성인이 된 그들의 행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가혹했던 시절에 평범한 십대 꼬맹이는 뭘 했을까,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뿐더러 알려 주는 책 또한 많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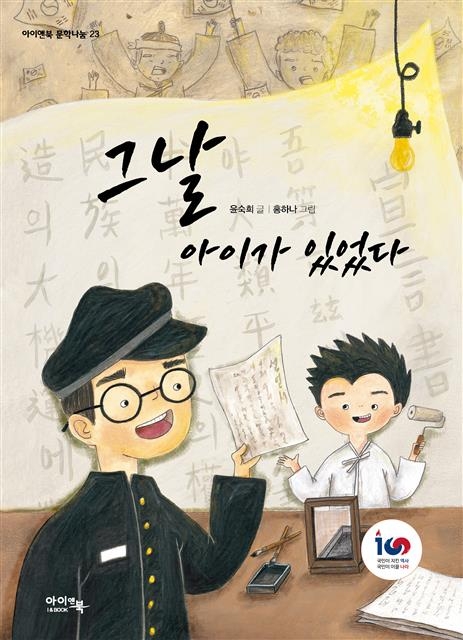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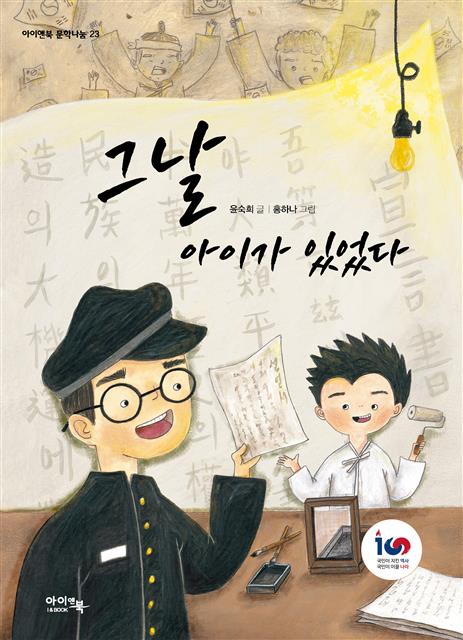
100년 전의 어린아이는 3·1운동을 겪으며 급속히 달라졌다. “만세 부른다고 달라진 거 없잖아” 하던 재경은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그러는지를 알게 됐다. 아이에게 나라의 독립이란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영광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 터다. 의병을 일으키려다가 탄로 나서 도망친 아버지가 숨어서 백지 편지를 보내 와야 하는 사연, 이웃 마을 고등학생인 창환이형이 만세를 외치다 일본 순사의 총탄에 맞아 죽는 것처럼 가슴에 사무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재경은 아이의 몸으로 용감한 길을 떠난다. 달 밝은 밤에 보따리 하나 들고 먼 길을 가는 재경의 등을 토닥여 주고 싶은 동화다. 그런 시절을 건너 오늘이 있다는 것이 슬프고 또 고맙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9-02-22 3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