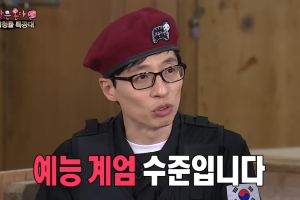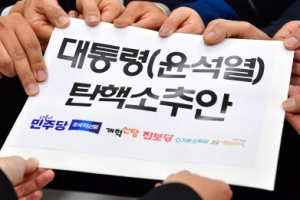대남 노선 대전환하고 협박하는 김정은
방어전쟁 핑계 영토확장 가능하단 논리
‘현상유지’ 국제법 원칙에 위배된 발상
북한 최고지도자의 관념이 두 교전국이 대치하는 한반도의 현실을 비로소 따라잡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6돌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한국 괴뢰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령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지난달 15일 시정연설의 내용을 반복했다. 그 결과 “우리는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 대화나 협력 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 버릴 수 있었다”고 선언했다. 평양은 지금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 정념과 ‘폭력의 독점체’인 국가 조직 사이에 존재했던 한반도의 배리(背理)에 종지부를 찍고 있는 셈이다.우선 한반도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는 주권국가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받아들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에는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회원국의 의무가 적시돼 있다. 주권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은 1928년 미국 국무장관 프랭크 켈로그와 프랑스 외무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이 체결한 이른바 ‘부전(不戰)조약’의 핵심인 국가의 교전권 부정에 권원(權原)을 둔다. 전쟁을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해 정복을 포함한 영토 변경을 당연시했던 국가의 ‘전쟁권’을 국제법적 불법행위로 단죄, 1945년 이후 국제사회 평화의 토대를 제공했다. 한국을 사실상의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김정은의 대남 전략 전환은 의도하지 않았을 귀결로, 남북 관계에서 영토 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현상유지 원칙 생성의 가능성을 열었다.
다만 평양의 한반도 복수 주권국가 인정 선언이 갖는 불완전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는 이른바 ‘자위 전쟁’으로서 국제법적 합법성을 갖는다고 보는 듯하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유엔 헌장 제51조를 염두에 둔 발언인 셈이다. 침략 전쟁이 아닌 방어 전쟁에서는 영토 보전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영토 확장, 더 나아가 영토 정복 또한 가능하다는 북한의 논리는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방어 전쟁과 침략 전쟁을 구분할 객관적 기준이 부재한 현실에서 영토 보전 원칙을 후자에만 적용하고 전자에는 예외로 취급한다면 군사행동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국제법의 다수 해석이 자위 전쟁의 방어국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위권의 범위를 공격국을 자국의 영토에서 격퇴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까닭이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한반도에서의 자위 전쟁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유일한 무력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행사 범위가 주권국가인 한국의 영토를 정복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 한국이 북한의 영토를 침략한다는 평양의 가정이 현실성이 없거니와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북한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위권의 범위는 ‘전쟁 이전의 현상 복구’를 넘어설 수 없다.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는 영토 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현상유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평양의 관념이 복수 주권국가가 존재하는 한반도의 현실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삼는 유엔 헌장의 국제법적 현실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2024-02-2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