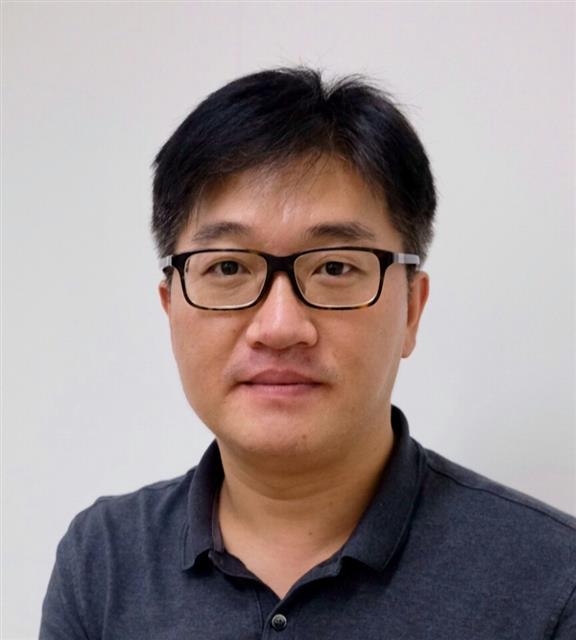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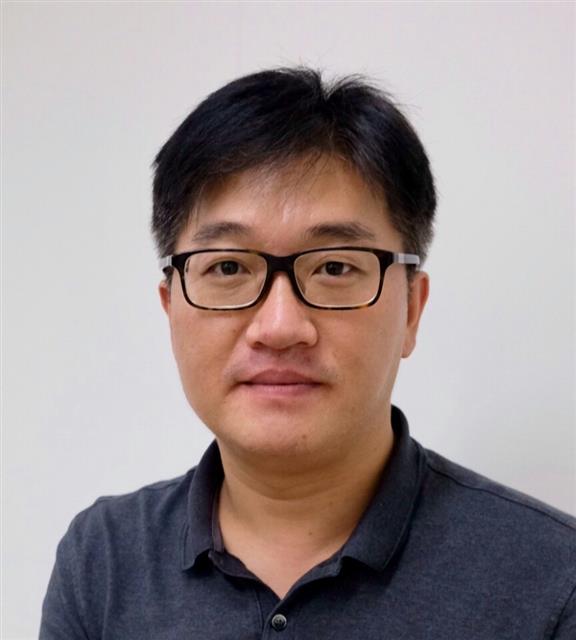
이두걸 논설위원
현대전에서 보병 위주의 지상군 작전이 불필요하다는 건 육군사관학교 교본에도 나온다. 그럼에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모병제를 반대한다. 이는 오답 쪽에 가깝다. 지난해 이동환·강원석의 ‘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논문은 육군의 2030년 모병제 전환 비용을 7조원 정도로 제시한다. 병사 한 명당 20대 근로자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전체 병력을 2030년 52만 2000명으로 감축한다는 정부 계획이 유지된다는 전제다. 2030년 병력 유지비 증가분은 11조 5000억원에 달한다. 지금의 국방 예산 수준을 유지한다면 12년 뒤 모병제를 도입해도 정부가 추가로 지갑을 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현재 1.3%인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을 프랑스(0.6%) 수준인 30만명으로 낮추면 현재 예산으로도 당장 모병제 시행이 가능하다. 1조~3조원의 여유가 생겨 전력투자비로 돌릴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징병제로 과잉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은 엄청나다. 프랑스 수준인 30만명을 초과하는 22만명의 병력이 경제 활동에 종사해 올해 최저시급 기준 연봉인 17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3조 7000억원의 비용이 국방 분야에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대체복무인력 기회비용 등까지 합치면 징병제 유지 비용은 10조원을 넘고, 반대로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국가 전체 GDP 증가 효과는 매년 3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수지 타산만 따지면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낫다. 병력 감축에 따른 모병제 시행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앞둔 우리 현실에도 맞는 데다 전문화를 통해 정예군을 육성하는 계기도 된다.
징병제가 폐지되면 국방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까라면 깐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충성심과 기계적인 업무만을 요구하는 군대와, 창의성과 자발성으로 무장한 군대 중 어느 쪽이 더 강할지는 누가 봐도 명백하다. 2차 대전 당시 프랑스는 마지노선 고수라는 고루한 전술을 고집한 결과 ‘전격전’(blitzkrieg)을 내세운 독일에 점령당했다. 병력 축소가 간부들의 ‘자리 축소’로 이어진다며 모병제 도입에 소극적인 육군 내부의 분위기도 있지만 이를 배려할 만큼 우리 처지가 여유롭지 않다. 징병제가 폐지되면 저소득층만 주로 군 복무를 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면 군대를 어엿한 일자리와 계층 상승의 수단으로 개선하는 게 정도(正道)다. 베스트셀러 ‘힐빌리의 노래’ 저자인 J D 밴스는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출신이지만 군 복무를 계기로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의 젊은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었다. 미 해병대에서 근무하면서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학비도 번 덕분이다.
마침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도 올해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입영거부 사유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참에 국민개병제에 국한돼 있는 ‘국방의 의무’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게 어떨까. 양심적 병역거부자 외에도 일반 복무 대상자들도 복지나 안전 등 ‘사회복무’를 수행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게 예가 될 것이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그래야 우리 군이 ‘4일에 한 번꼴로 군인이 자살하는 군대’가 아닌 ‘동북아 중심 국가에 걸맞은 작지만 강한 군대’로 거듭날 것이다.
douzirl@seoul.co.kr
2018-06-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