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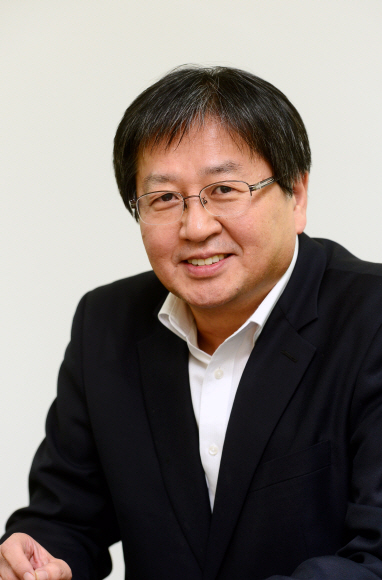
강동형 논설위원
최근 한 모임에서 “경제 주체 가운데 기업만 보이고 가계와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푸념 아닌 푸념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생각난 게 상도와 계영배였고, 이 땅에 ‘기업가 정신’은 살아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겠지만 ‘기업이 이(利)를 추구하면서 의(義)를 함께 구하는 것’이 전통적 의미의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을 혁신과 창조적 파괴에 있다고 봤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잘 살아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등장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기업가 정신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의 기업가 정신’을 ‘생산성 최적화와 적정 이윤’에서 찾고 있다.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이윤 극대화’가 아닌 상생의 원리가 작동하는 ‘적정 이윤’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도’와 ‘계영배’가 갖는 기업가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그 기업은 더욱 빛이 난다. 얼마 전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직원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나눠 준 것은 기업가 정신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새해 벽두부터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중국의 불안정한 금융시장,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로 시작되는 양극화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는 연초부터 화두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며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용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한국은행과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몫은 1990년 70.1%에서 2014년 61.9%로 약 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기업소득은 17%에서 25.1%로 8%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국가)소득은 13%에서 13.1%로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GNI 가운데 가계소득이 줄어든 만큼 기업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2000년 기준으로 2014년까지 누적 경제성장률은 73.8%인데 제조업 평균 누적 실질임금상승률은 52.7%, 이를 전 산업으로 확대한 누적 실질임금성장률은 35.8%에 그쳤다. 이 역시 경제성장의 과실 가운데 근로자의 몫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기업에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이 쌓였고, 사회는 양극화와 청년 실업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제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기업은 정부와 가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투자 여력도 충분하다.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직원들의 임금과 주주 배당을 늘려야 한다. 대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대기업이 중견기업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적정한 용역비나 납품 값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기업과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각각 상위 기업의 60% 수준이라는 것은 상생 경영이 아니다. 기업이 못 하면 정부가 나서서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 헌법 119조 2항은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주체 간 조화를 위해 정부의 조정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2016년! 기업이 ‘상도’를 회복, 실천하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yunbin@seoul.co.kr
2016-01-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