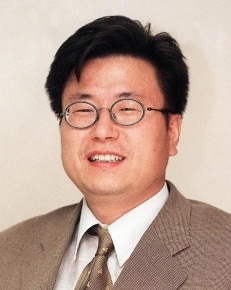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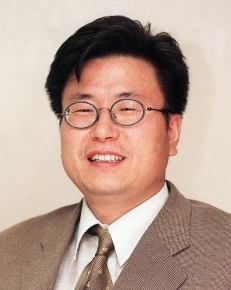
오일만 논설위원
문제는 후계자의 자질과 경영능력이다. 우리의 재벌 3세들은 대체로 어릴 때부터 뭐 하나 부족함을 모르고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났다. 잘난 부모 덕에 외고 등 특목고를 나와 해외 명문대나 MBA 등 최고의 교육도 받는다. 청년 백수들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이들은 한 번의 좌절도 없이 입사 후 5~7년이 되면 임원으로 승진한다. 경제개혁연구소의 2013년 경영권승계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대졸 신입사원은 부장까지 17.3년, 임원까지 21.2년의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25살에 입사해서 7년 만에 임원이 됐고 부사장이 되기까지 1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동생들은 더 빨라서 조원태 부사장은 3년, 조현민 전무는 4년 만에 임원이 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등 재벌 3세들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이런 주마간산(走馬看山)식 경영수업으로 제대로 된 조직문화를 익히기도 어렵고 직장인들의 애환을 이해하기도 힘들다. 경영권을 쉽게 물려받으니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이 생기고 독단에 빠지기도 쉽다. 올바른 인성과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춘 3세도 있겠지만 대체로 회사직원을 자신들의 소유물쯤으로 여기는 사고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땅의 월급쟁이 미생(未生)들의 공분을 샀던 땅콩회항 사건이 비뚤어진 재벌 3세의 일탈행위가 아닌, 우리 재벌의 구조적 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벌 3세들은 매뉴얼대로 하는 교육에 익숙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럭저럭 회사를 꾸려갈지 몰라도 돌발적인 위기상황이 닥치면 우왕좌왕하는 특징이 있다. 거센 풍파를 헤쳐가는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벌 2세가 경영하는 30개 기업 가운데 17개가 문을 닫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매출규모 국내 20위 기업 가운데 재벌 3,4세가 경영에 참여하는 곳은 95%(19개)에 달한다. 지금의 추세라면 재벌 3세들은 향후 10년 내 경영권을 승계해 최고경영자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가능성이 크다. 검증도 없이 중책을 맡고 맡은 사업이 실패해도 책임을 지는 경우도 드물다. 한국 경제는 물론 한 국가의 운명이 검증받지 못한 재벌 3세들에게 좌우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투자의 귀재로 미국의 5대 갑부로 꼽히는 워런 버핏은 경영권 세습을 빗대 “2020년 올림픽 대표팀을 200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자식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창업주는 기업을 세우고 2세는 물려받고 3세는 파괴한다”는 서양 격언과 비슷한 맥락이다. 경영을 해야 할 3세와 해서는 안 될 3세를 가려내는 일도 어찌 보면 재벌 총수들의 의무일지 모른다. 재산이야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되지만 기업의 경영권 세습은 다른 문제다. 재벌기업의 부실과 몰락은 주주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경영권만큼은 실력으로 맡을 수 있는 경쟁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능력 없는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것인지, 재산은 물려주되 경영권을 따로 떼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oilman@seoul.co.kr
2014-12-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