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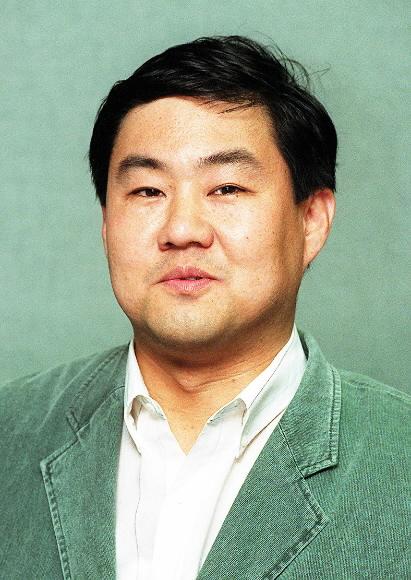
서동철 논설위원
지난주 새만금을 찾았다. 변산반도 쪽 초입에 자리 잡은 새만금 홍보관에서 바라본 방조제는 흔히 듣던 ‘대역사’(大役事)란 단어의 뜻이 이런 거구나 싶을 만큼 장관이었다. 그런데 둑길을 따라 야미도의 횟집으로 달려가면서 조금씩 편치않은 심정으로 바뀌어 갔다. 이렇게 땅과 바다의 모습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어 놔도 뒤탈이 없을지 슬금슬금 걱정이 되는 것이었다. 과거엔 배를 타고 한참이나 달려야 닿을 수 있던 야미도만 해도 지금은 육지나 다름없는 둑방의 징검다리가 됐다.
새만금 간척은 그 사업 초기부터 적지 않은 저항에 부딪쳤던 것이 사실이다. 공사가 시작된 것이 1991년이니 무려 23년 전의 일이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나는 그 절실함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방조제가 완성된 다음에야 뒤늦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고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성으로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완성된 방조제를 어찌할 수 없을 뿐, 흔쾌하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늘었으면 늘었지 줄었을 리 없다.
신앙이 있든, 없든 만물에 신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는데 크게 거부반응은 없을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존재가 하느님이다. 반면 우리 민속신앙에서는 세상 만물에 저마다의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과 동진강에는 각각의 수신(水神)이 있고, 주변 땅에는 지신(地神)이 있다. 그 너머 바다에는 서해용왕(西海龍王)이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종교라기보다는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는 우리 민속신앙일 것이다.
이런 이치에 따르면, 만경강수신과 동진강수신, 새만금지신과 서해용왕은 요즘 말로 너 나 할 것 없이 깊은 ‘멘붕’에 빠져 있을 게다. 돌이켜 보면 우리 조상은 집터를 다질 때도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지신에게 고(告)하고 허락을 받는 집터다지기 소리를 했다. 인간과 땅과 지신이 일체화하는 제례행위이자 생활과 신앙이 하나 되는 축제라고 민속학에서는 설명한다. 그저 작은 집 한 채를 새로 짓는데도 이랬을진대 지도의 모습을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며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다면 천벌을 받고도 남을 일이라고 옛사람은 노(怒)했을지도 모른다. 엉뚱해 보이겠지만 지신과 용왕에게 방조제를 쌓은 데 대해 용서를 받고 본격 개발에 앞서 허락을 얻는 것은 사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다. 지신과 용왕의 심기를 풀어주려는 노력은 곧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듬는 노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주변을 돌아보며, 이 사업으로 상처받은 신과 인간의 해원(解寃)을 위해서는 박물관을 지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본격 농업사박물관과 해양생활사박물관을 이곳에 세우자는 것이다. 농사체험장을 겸한 농업사박물관은 변산 쪽 새만금 입구에 만들어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양생활사박물관의 최적지는 당연히 둑길로 연결된 야미도와 이웃한 신시도 일대다. 이 섬들이 속한 고군산군도는 최근 새만금사업지구에 편입돼 새만금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생활사박물관을 짓는 데 제약조건은 사라진 듯하다.
농업사박물관과 해양생활사박물관에서 펼쳐질 지신제와 용왕제는 지신과 용왕을 위로하는 행사에 머물지 않는다. 새만금 개발 사업으로 흩어지거나, 또다시 흩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민심을 다시 한데 모으는 것은 물론 새만금의 대표적 명물 축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축제의 주인공은 지신과 용왕이 아니라 사람이다.
dcsuh@seoul.co.kr
2014-07-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