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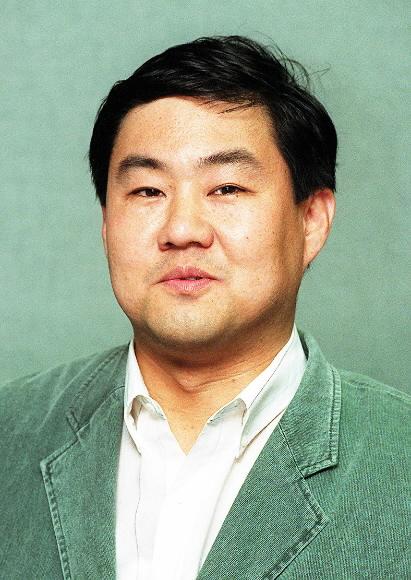
서동철 논설위원
다른 나라의 문화재 보존 노력에는 찬사를 보내는 한국인들이 애써 외면하려는 사실이 있다. 서울 역시 어디를 파도 유적과 유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600년 동안 수도의 역할을 했던 도시다. 당시에도 갖가지 건물이 빼곡하게 사대문 내부를 채우고 있었다.
특히 종로는 조선 상업의 중심지였다. 길 양쪽에는 오늘날과 다름없이 상점이 줄지어 있었는데, 태종이 추진한 시전행랑 조성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2010년 탑골공원 옆 모서리에는 육의전빌딩이 세워졌다. 일종의 국가조달 상점인 육의전이 자리잡고 있던 곳이다. 발굴 조사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광복 이후에 이르는 6개의 문화층이 드러났다. 조선시대 대표적 상업 시설의 변천사가 고스란히 지하에 남아 있었던 셈이다.
빌딩 신축이 결정된 것은 2008년이다. 중요한 유적이었으니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을 무마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지하에 유구를 보존하고, 건물을 세우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물관을 세우는 계획도 더해졌다. 지하의 선사 유적지를 보존하고, 아파트를 올린 프랑스 니스의 테라 아마타(Terra Amata) 고인류학 박물관의 전례가 있으니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종로구청이 건축주를 고발했다는 뉴스가 며칠 전 들려왔다. 건물주는 신축 계획이 통과되자, 박물관의 운영 재원을 마련하려면 건물을 한 층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지만 박물관 개설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육의전 유구는 결코 보존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몰골로 변했다. 건축 계획 당시 ‘개발과 보존의 윈윈전략’이라고 기사를 썼던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다.
육의전의 사례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면 서울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지하 유적의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란 국민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하 문화재 보존에 대한 국민 전체의 컨센서스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실제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종각에 이르는 종로 초입은 이미 거대한 빌딩 숲으로 변모해 버렸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종로 유적을 부분적으로라도 보존하는 방안이 없지는 않다. 공공기관을 재배치하는 방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시 입주 대신 종로의 건물을 매입한다면 사실상 영구적 보존 방안이 된다. 최종 결정 과정이 남아 있지만,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머문다면 부산청사 구입에 들어갈 비용을 돌려 쓰면 된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종시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면, 문화부는 고유 목적인 문화 중흥에 기여해도 좋을 것이다.
경복궁 터를 비워주어야 하지만, 이전 부지를 마련치 못해 애태우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당장이라도 종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 민속박물관이 종로의 도심형 박물관으로 거듭나면 교통의 요지에서 더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을 수 있게 된다. 사들인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지하 일부를 발굴하면 그대로 ‘조선 상업사관’이 된다. 지하 유구의 영구 보존을 겸하는 새로운 개념의 민속박물관은 세계의 어느 박물관 교과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명물이 될 것이다. 인사동과 민속박물관, 종묘, 국악의 거리를 잇는 일대가 거대한 전통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하는 것은 덤이다.
dcsuh@seoul.co.kr
2013-09-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