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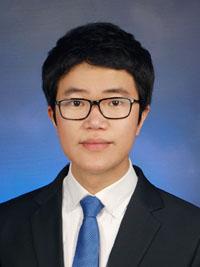
이성원 사회부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우려가 쏟아진다. 권한이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도 빠졌고, 독립감시기구 설치도 무산됐다. 경찰은 수사·국가·자치경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제도를 설계했다지만, 수십 년간 고착돼 온 경찰청장 ‘원톱’ 체계가 하루아침에 ‘스리톱’ 체계로 유기적으로 운영될지 미지수다. 물론 세 주체 중 경찰청장이 힘이 가장 막강한 건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 것이다. 경찰청은 수사 전문가를 양성해 조직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수많은 수사관이 단시간 내 커진 권한만큼이나 수사력까지 뒷받침해 줄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봐주기’ 논란이 발생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특히 이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해석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뒤늦게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당시 블랙박스 등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수사 실익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해명하지만,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당시 폭행이 정차한 차량 안에서 이뤄져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정차한 택시라도 계속 운행이 예정돼 있다면 운전자 폭행·협박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한 만큼 특가법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건 분명해 보인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로 삼는 건 바로 이 지점이다. 왜 누군가에겐 법 적용이 엄격하며, 누군가에겐 관대하냐는 것이다. 경찰의 해명대로 이 차관이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현 정부 실세라는 걸 몰랐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우려는 현실이 된다. 특히 내년에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다. 내사종결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요구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묻힐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된 상태에서 초동대처 실패 논란이 발생하면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은 엇박자를 보이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 차관 사건을 두고 경찰이 해야 할 일은 해명에만 온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lsw1469@seoul.co.kr
2020-12-2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