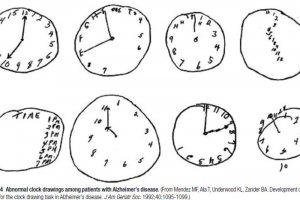천운영 소설가
처음 시계를 소유한 순간을 기억한다. 시계를 온전히 내 몸에 소유할 수 있다니. 어쩐지 성인으로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어른까지는 아니어도 어린이에서 벗어난 것만은 확실했다. 그런데 사실 썩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아니었다. 곱상한 바늘시계이길 바랐는데 전자시계였다. 시계를 읽을 줄 모르는 어린애도 아니고, 흔해 빠지고 투박한 전자시계라니. 그래도 내 첫 시계인데 미워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 시계는, 그러니까 내 시계는, 이것이 바로 태양열 충전 시계란 것이다,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빛이 날, 불사의 시계!
나는 그 투박한 시계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작정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시계였다. 태양빛을 쬐어 주면 시들시들했던 숫자가 서서히 되살아나는 모습이라니. 광합성을 하는 식물 같았다. 태양의 힘을 잘 느끼려면 일단 방전을 시켜야 했다. 아주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래서 어둠 속에 숨어 숫자가 희미해지길 기다렸다가 햇빛으로 나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곤 했다. 왼손을 번쩍 치켜든 채 햇빛 속으로 달려 나가는 나는 태양과 교신하는 우주 전사였다. 그렇게 나는 양지와 음지를 무던히도 뛰어다녔더랬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계가 사라졌다. 싫증난 것도 아닌데,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 영원할 줄 알았는데, 사라져 버렸다. 분명히 차고 나왔는데. 어디서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쏘다녔다. 무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진 느낌이었다. 떠난 애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듯 왔던 길을 전부 훑었지만, 시계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결별의 원인은 가죽줄에 있었다. 가죽줄이 땀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 내가 태양과 교신하는 동안 얇디얇은 가죽줄은 삭아 가고 있었다. 시계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시곗줄에게는 가혹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버려진 것은 내가 아니라 시계였다. 내 부주의가 시계를 버렸다. 손목 위에 허연 시곗줄 자국이 한동안 남아 있다가 사라졌다.
할아버지의 괘종시계는 다섯 시 십오 분에 멈춰져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태엽을 감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오랜만에 열쇠를 꺼내 뻑뻑해질 때까지 태엽을 감은 다음 시계추를 흔들어 깨웠다. 죽은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남대문까지 가서 장만한 괘종시계를 품에 안고, 다시 그 길을 되짚어 오는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쫌 멋쟁이셨으니, 백구두를 신고 그 길을 걸으셨을 것 같다. 어쩌면 해가 지고 있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아주 길게 늘어지면서 저녁 시간을 알리는 해시계가 되었을 것이다. 그림자 시곗바늘이 내 심장을 가리켰다. 심장에서 댕댕댕댕 괘종 소리가 울렸다. 어쩌면 내 첫 시계도 어딘가에서 살아 있을지 모르겠다. 여전히 흐려졌다 선명해지기를 반복하면서, 태양과 교신하며, 식물처럼 자라나고 있을 것이다. 태양이 있는 한.
2015-11-1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